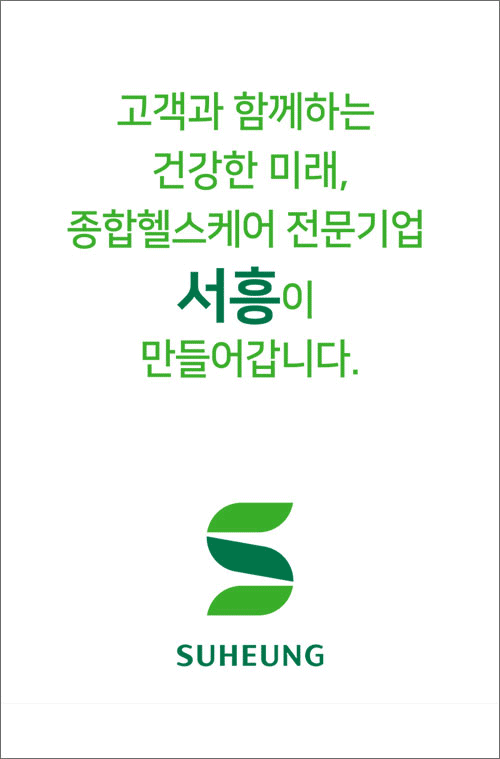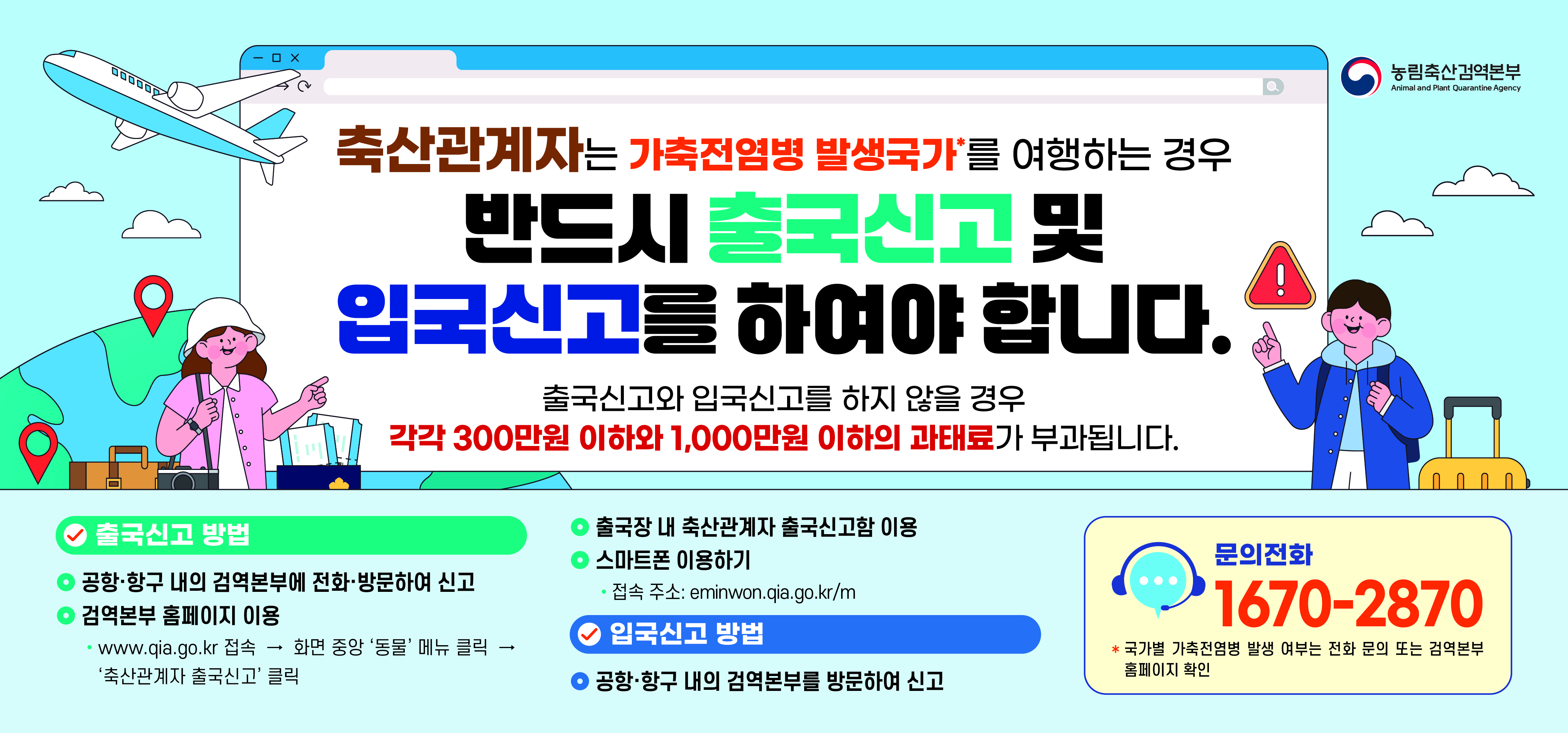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살충제 계란’ 파문이 전국으로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정부의 허술한 친환경 인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소비자들을 당황하게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 조사 결과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7곳의 산란계 농가 중 6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1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1개 농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부의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펜트린이 기준치보다 21배나 높게 나타난 전남 나주의 산란계 농가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껏 일반 계란 대비 40%가량 비싼 값에 무항생제 계란을 사먹어 온 소비자들은 정부에 속은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산란계 농장 1060곳 중 73%인 780곳이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로, 이들 농장에서 생산하는 계란이 전체 유통 물량의 80∼90%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가 처음 도입된 1999년에는 농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관리원이 업무를 전담했으나 2002년부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시작해 올해 6월부터는 업무자체를 모두 민간에 이양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정부가 친환경 인증을 주는 민간 업체들의 난립과 인증남발을 방치하고 인증 기준을 허술하게 관리해 온 탓이라고 말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부실인증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처음부터 문제가 많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식품안전을 기한다는 명분으로 무턱대고 시행한 것이 잘못이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말 하면서도 정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제도를 민간에 이양했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일찌감치 이런 문제를 파악하고 작년 9월 무항생제 인증을 강화하는 내용의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보면 이미 사건발생을 예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정부는 인증 업무로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을 그치지 않고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직불금을 지원하여 정부예산을 낭비하였고, 상품에 친환경 마크를 붙여서 그렇지 않은 상품보다 가격을 2배 가까이 비싸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서 소비자를 우롱한 꼴이 되고 말았다.
농식품부는 지금부터라도 주먹구구방식인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제도를 폐지하고 과학적인 관리방식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인 GAP로 일원화시켜서 식품안전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아가 생산부서인 농식품부가 GAP를 비롯한 동물의약품, 농약관리 등의 식품안전업무를 관장할 것이 아니라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담당하고 있는 식약처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이관해야 한다. 그래서 식약처가 생산단계와 유통단계에서 이중으로 식품안전 그물망을 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해야 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GAP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이중으로 시행하고 생산관리부서인 농식품부가 식품안전업무까지 관장하겠다는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 식품안전사고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바로잡아 차후에 이러한 사고를 막아야 한다. 그리고 살충제 계란파문을 계기로 식품안전행정의 일원화가 제대로 확립되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