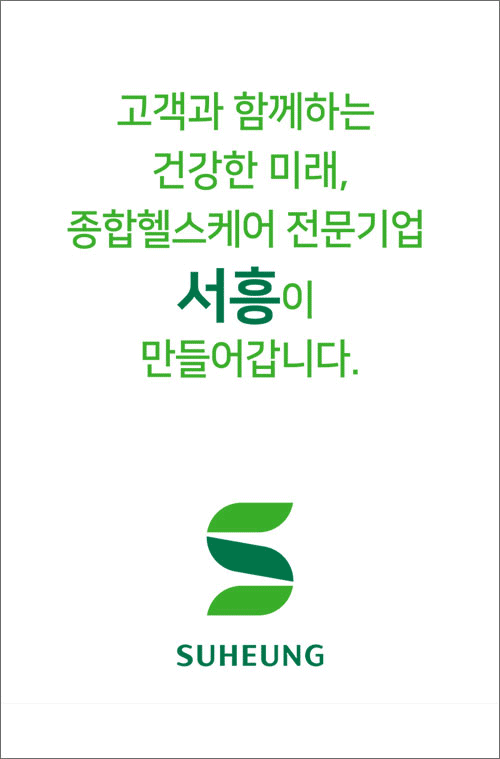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현지 공장부터 유통 후까지 단계별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으나 대체로 이미 시행 중이 제도이거나 지난 25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과 중복된 내용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생산단계 대책으로 발표된 수출업체 사전확인등록제와 현지실사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로 식약청은 이들을 개선하거나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위생관리 사전확인등록제도는 위생수준이 우수한 수출업소에 대해 식약청이 인증을 하면 통관 검사를 완화해 주는 제도로 이미 지난 2003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그동안 단 한 업체도 인증을 받지 못했을 정도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 현재 이탈리아의 한 올리브유 업체가 현지실사를 거쳐 처음으로 인증이 예상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국내 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앞으로 수출국 정부의 인증만으로 적합 업소로 인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지실사도 2006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4개국 연 2회에 불과하며 수많은 개별 업체에 대한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수출국 정부와 협의 없이도 수시로 실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최대 수입국인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다.
우수수입업소제도 역시 제도의 명칭은 없었지만 현재도 업체별로 무작위 검사 비율을 달리 적용하는 시스템이 일부 적용되고 있다.
위해식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식품 수출국가와 체결하는 '위생약정(MOU)' 역시 확대될 예정이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중국, 칠레 2개국과 위생약정을 체결했으나 최근 '생쥐 머리' 새우깡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신속한 현지실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위해 수입식품 사범에 대한 제재강화 대책은 부당이익환수제, 집단소송제 도입 등 지난 25일 발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식품 수입업체가 대부분 영세하고 피해를 배상할 자산도 거의 없다는 점에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소송제가 효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서갑종 수입식품 과장은 "수입식품 대책은 대체로 통관 이전 단계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며 "원인 제공자가 현지 생산업체일 경우 피해 배상 문제는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고작 '반(半)제품 가공국가 표시 의무화' 정도다. 이 제도 역시 반제품의 정의가 모호해 어느 정도까지 소비자 알권리가 신장될지 불분명하다.
기존 정책의 재탕, 3탕 수준으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서 과장은 "수입업체 수준별로 통관 검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나 제조공장 등록 의무화, 집단소송제 등을 실시하면 수입식품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쳐 위생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