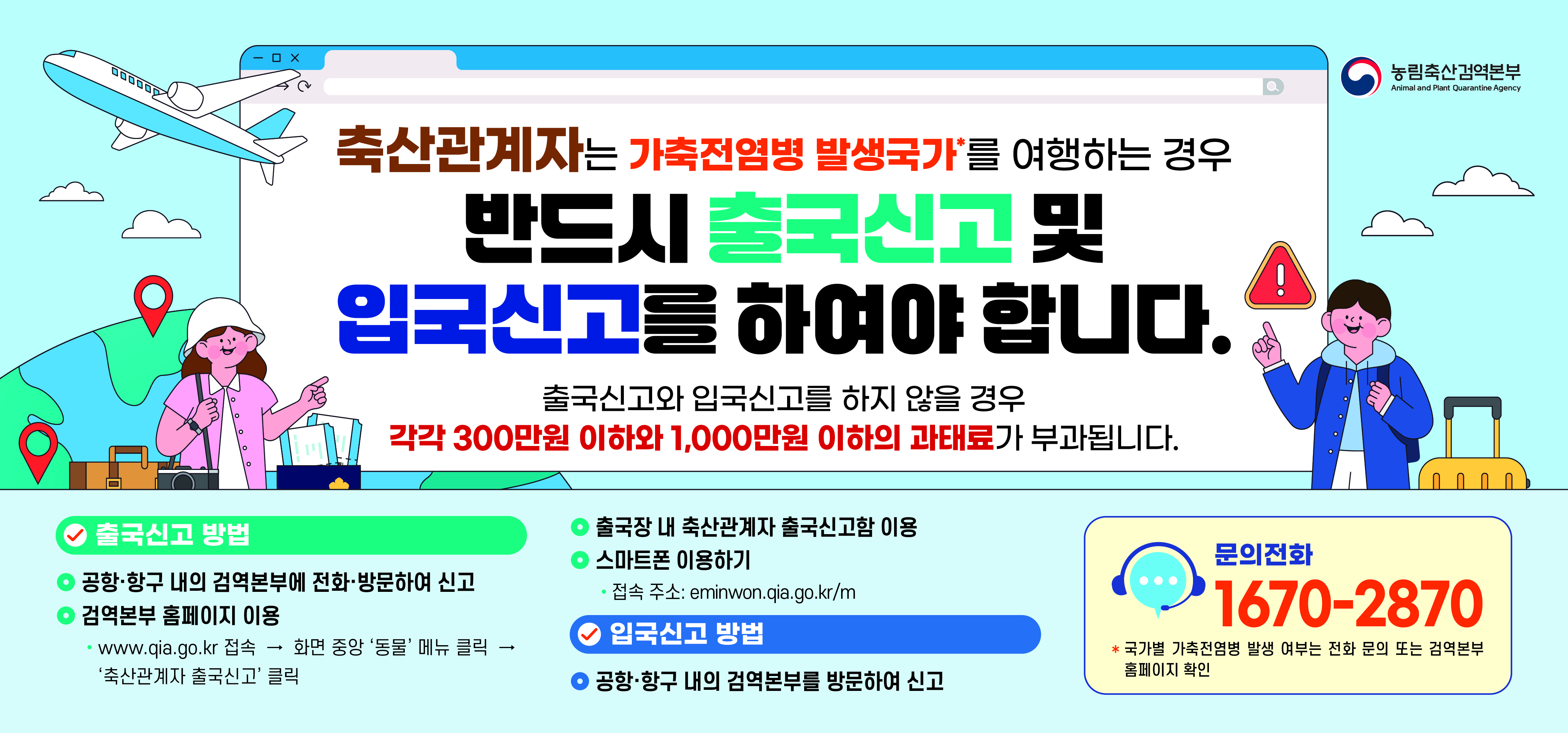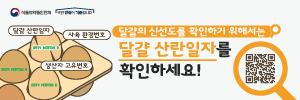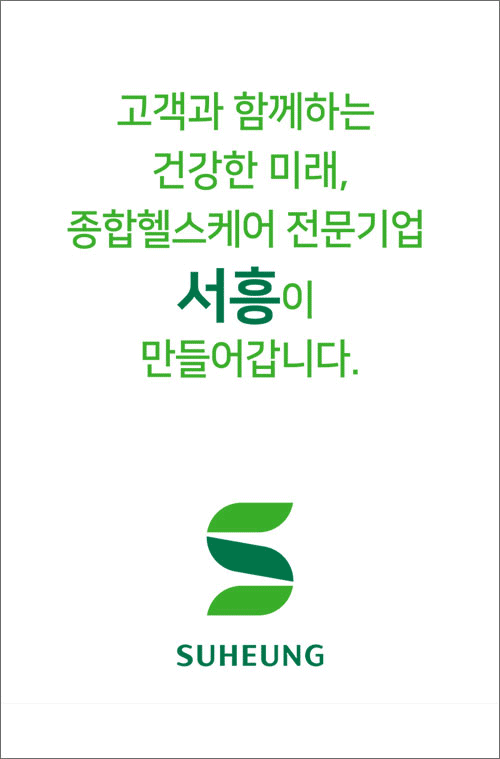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늘, 항상, 몹시 불안하고 사람들에게 말 못할 가위눌림에 시달리던 가을, 운명적으로 고승(高僧)을 만나 피가 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태생적으로 욕심많고 극단적인 성격인 너는... 역마살이 들끓고 너 스스로 외로운 삶을 자처하는 너는... 그리하여 너는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마땅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배를 타고 여행이라도 가거라"
흘려듣기에 조언이 너무나도 와닿았던 저는 제주도와 일본여행을 다녀올까도 생각했지만 사찰을 방문해 기도를 한다면 "내가 자각하고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초적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차에 배편이 있는 사찰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경상남도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연화도의 연화사를 선택했습니다.

경상남도, 그 중 부산은 출장이나 여행으로 방문한 적은 있지만 통영은 막연한 곳이었습니다. 윤이상과 박경리의 고향으로 알려진 예술과 문학의 도시, 하지만 그들의 출생만으로 그러한 미사여구를 붙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버스를 타고 4시간 10분을 타고 바람이 불지 않고 배가 뜨느 날,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연화도의 연화사는 가는 길 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가벼운 트레킹 코스 조차도 버거워 하는 제 자신이 생활적인 면에서 지나치게 편하게 살고 육체를 쉬게 해줬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연화도는 그 어느곳 보다 불심이 강한 섬입니다. 연산군의 억불정책으로 피신한 승려가 깨우침을 얻어 도인이 됐고 입적하면서 바다에 잠들었고 그 후로 연꽃이 피어났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연화도는 보덕암의 해수 관세음보살상이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화도는 모든 길이 다리를 통해서 이어집니다. 출렁다리를 건너면 펼쳐지는 동두마을과 또 다른 북쪽의 다리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우도, 작은 곳이기 때문일까요. 두 곳 모두 색채와 특징이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르막이 나오면 내리막이고 내리막이 나오면 오르막이고 "내가 미쳤지, 다신 안와...etc"를 안과 밖으로 외치는 여정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절대 만날 수 없는 신선한 해초와 돌멍게, 쥐치,밀치,돔. 강원도의 바다와 남해의 바다는 해저지형이 다른만큼 신선도와 깨끗함이 달랐습니다. 이곳에서 흔히 말하는 '고기'는 육고기가 아닌 생선이고 meat는 육고기라고 철저하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점도 처음 알았습니다.

그 곳에서 먹었던 모든 음식은 평가라는 말이 교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등산화를 신고 가도 힘들 길에 트레킹화도 없이 얇은 플랫슈즈만으로 돌산을 지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평지의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삶을 대하는 방식이 본인중심적이고 무지한지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모든 물자가 귀한 섬에서 휴지 한 장, 물 한모금, 과자 한 봉지가 얼마나 소중하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인간이 지능이 높고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스워 보이는지도 배웠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은 쉽게 흥분을 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그 여유를 경제적인 것에만 편중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론 감정적인 여유도 경제적인 것에서 나오겠지만 조급함이라는 것이 사람을 얼마나 값어치 없이 보이게 하는지도요.
빗자루병에 걸린 대추나무 수십 그루가 어느 날 이시에 죽어 자빠진 그 집, 십오년을 살았다.
달빛이 스며드는 차가운 밤에는 이 세상 끝의 끝으로 온 것 같이 무섭기도 했지만
책상 하나 원고지, 펜 하나가 나를 지탱해 주었고 사마천을 생각하며 살았다.
그 세월 옛날의 그 집,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로지 적막뿐이었다.
대문 밖에는 늘 짐승들이 으르렁 거렸다. 늑대, 여우, 까치독사 하이에나도 있었지.
모진 세월 가고 버리고 갈 것만 남아서 참 홀가분하다.

채우는 것도 좋지만 버리는 것도 미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할 나이를 받아들여서일까요. 박경리 작가의 절절한 울림이 현명한 목소리로 들립니다. 미천한 중생이자 속물인 저는 다시 속세로 돌아와 그날의 느낌이 퇴색됐고, 변한 것이 없겠지만 교만한 태도로 아예 모르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도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연화도의 밤, 동료기자에게서 믿기지도 않고 믿기 싫은 비보를 접했습니다. 일로 만난 사이였지만 서로의 속내를 공유했던 십년 지기... 소중했던 내 친구, 그녀가 소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내세울 것이라고는 풋내음밖에 없는 치기어린 기사로 저는 그녀를 어지간히 괴롭혔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날의 상황이 여의치 못했기 때문에 그녀가 가는 길을 배웅해주지 못한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이 시간, 어느 정도 종착역에 도착했을 그녀...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서로 자신의 아들에게 애틋한 감정을 속삭였던 그 시절의 나와 그녀, 그녀는 제가 긴 여행을 떠나는 길목에 왜 나타나지 못했는지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에게 지은 빚이 많은 저는 아직도 그 여자를 생각하면 아직 하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남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릅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과 술 잔을 기울일 때 마다 함께 즐거웠던 기억을 생각하면서 그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 여행을 떠났지만 그녀는 영원히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는 친구니까요.
"매일 행복하진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있어"라는 마인드로 싱그럽게 웃었던 꽃 같은 그녀에게 통영에서 제가 했던 모든 기도를 바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