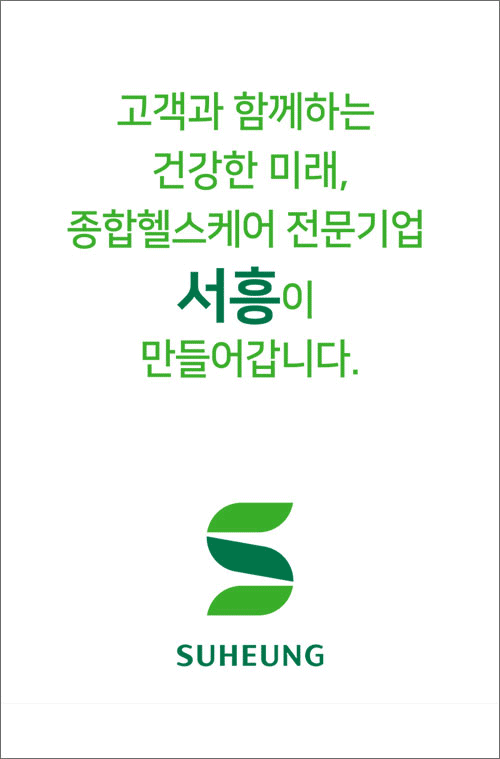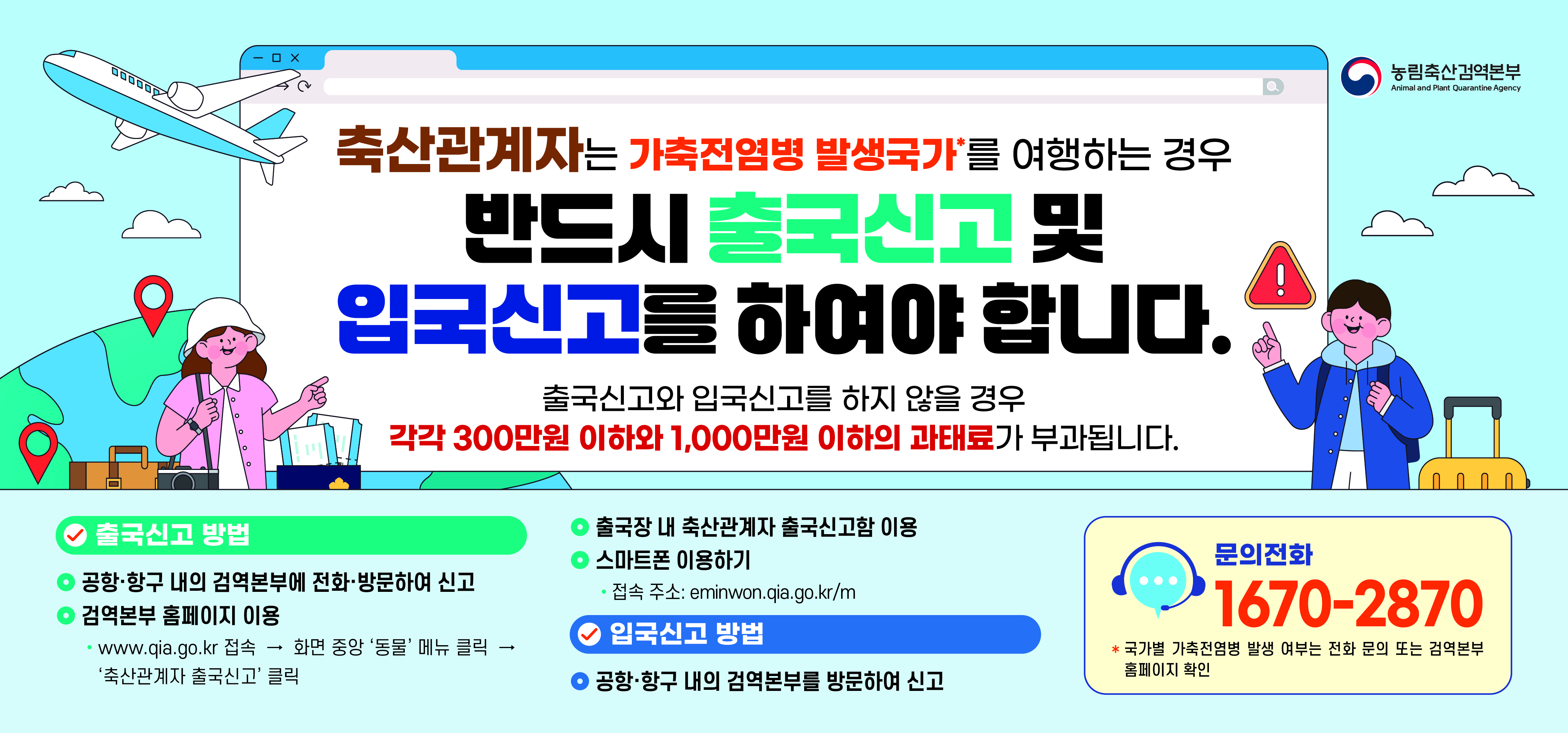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촌 인력난 해소의 핵심 수단으로 꼽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싸고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체류 기간 확대를 포함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비자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고수하면서 정책 혼선의 부담이 고스란히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6일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인력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둘러싼 부처 간 엇박자가 현장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발표한 ‘제1차 농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2026~2030)’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을 현행 최대 8개월에서 10개월로 확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외국인 체류·비자 정책을 관할하는 법무부는 체류기간과 연령 기준 모두 현행 유지를 강조하고 있어, 관계 부처 간 충분한 협의 없이 계획이 발표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5세 이상 50세 이하만 허용되며, 체류기간은 기본 5개월에 연장 3개월을 더한 최대 8개월로 제한돼 있다. 하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된 농가 구조와 작목별 작업 특성을 감안할 때 8개월 체류로는 안정적인 영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연령 기준 완화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현행 ‘25세 이상 50세 이하’에서 ‘20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조정해 신체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젊은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계절근로자 중 83%가 25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연령 상한을 45세로 조정하더라도 제도 운영에 큰 무리가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송출국과의 협의를 통해 연령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 중이다. 전북 고창군은 라오스 지방정부와의 MOU를 통해 계절근로자 도입 연령을 25세 이상 45세 이하로 적용하고 있다.
체류기간 확대 역시 농번기 인력 수요와 작목별 노동 특성을 고려한 현장의 요구다. 농식품부는 현행 8개월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최대 10개월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무부는 연령 기준과 체류기간에 대해 “각 연령대의 학업·취업 등 특성을 고려해 설정된 기준”이라며 현행 제도 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이미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된 바 있고, 숙련 근로자에 대한 비자 인센티브 제공, 장기 고용이 필요한 농가의 경우 고용허가제(E-9 비자)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농업계는 고용허가제에 대해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가 현실과는 맞지 않는 제도라고 지적한다. 제도 간 경직된 구분과 부처 간 조율 부재로 인한 부담이 농가에 전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식품부가 체류기간 확대 방안을 중장기 기본계획에 명시해 놓고도,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이나 관계 부처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두고 “실행력 없는 계획으로 기대만 키운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정희용 의원은 “고용허가제는 절차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간·계절성 노동 수요가 중심인 농촌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며 “현장이 요구하는 것은 제도 선택지가 아니라, 계절근로자 제도 자체의 현실화”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식품부는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는 답변을 반복하고, 법무부는 현행 기준 유지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농가들은 매년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며 “부처 간 책임 공방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농업 인력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농촌 현장에서는 “사람이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규정과 소관만 따지고 있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보조 인력이 아니라 농업 유지의 핵심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