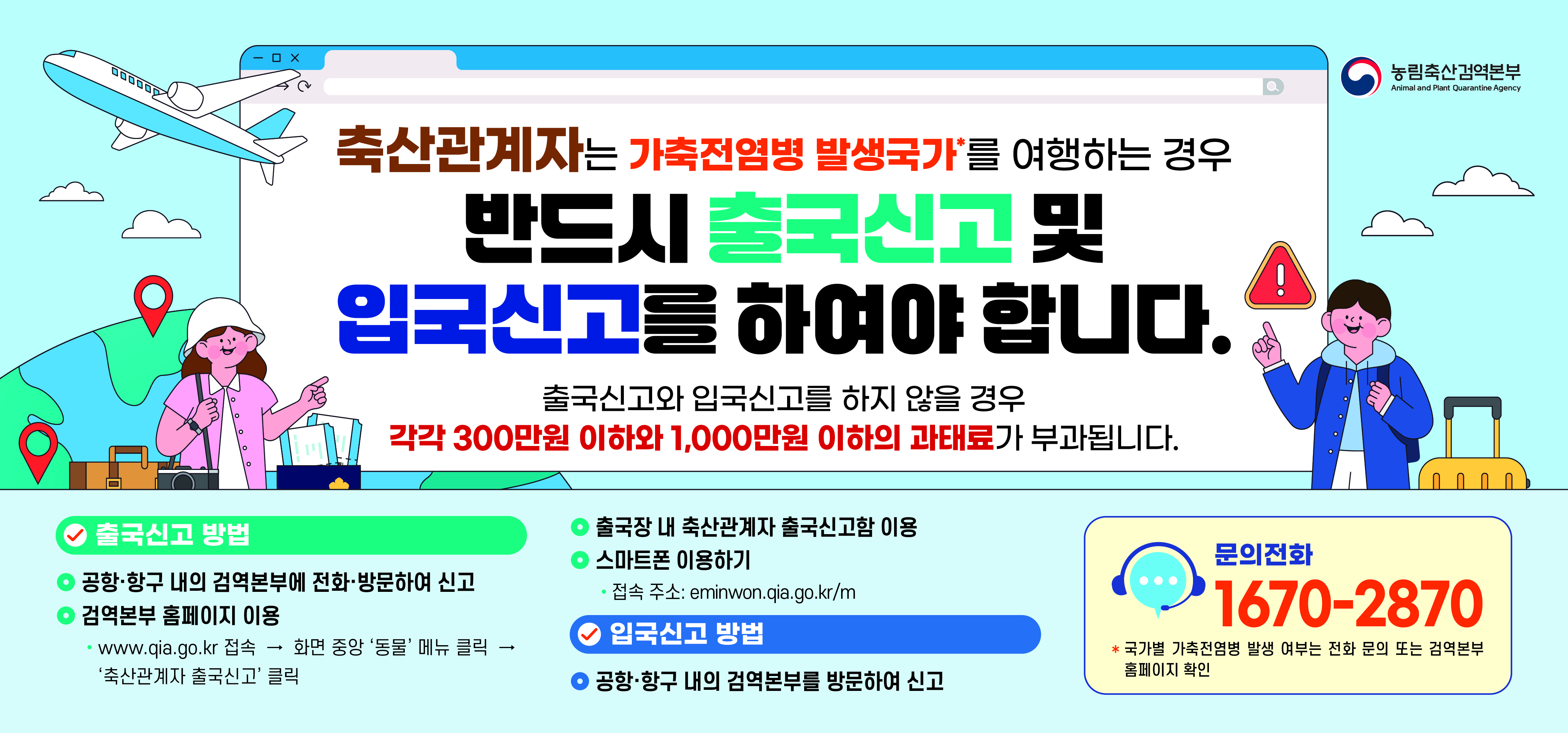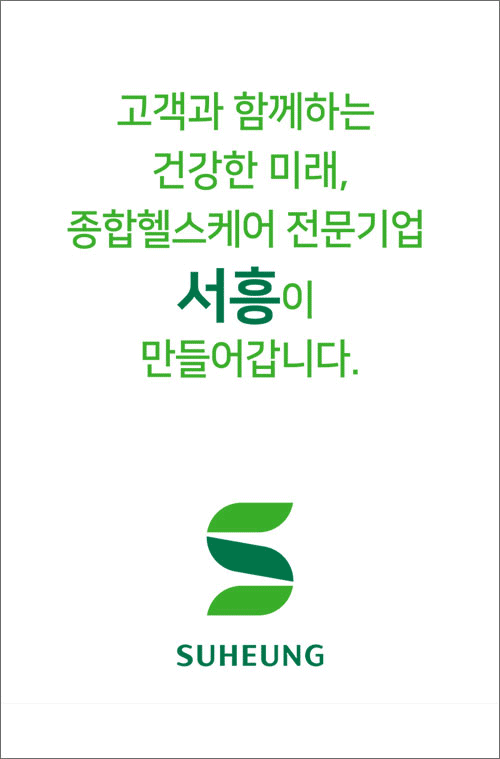정치적 배려에 의한 '퍼주기식'지원 잘못
국내 소비 증대 방안 등 마케팅 절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이후 시작된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로 위기에 처한 국내 농업이 FTA협정을 계기로 최대의 고비를 맞고 있다.
UR이후 10년이 흘렀고 그동안 농촌에 투입한 투융자비용도 57조원이나 돼지만 농가부채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한 채 FTA로 또다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UR이후 WTO규정에 따라 가격지지정책을 축소하기 위해 직접 지불제를 도입하고 농업의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으며 수출 및 기술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왔다.
그러나 정부의 농업에 대한 투자가 기반시설이나 유통시설 등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보다 개인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치우쳐 투자비용 대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최세균 박사는 "경쟁력 없는 농민에 대해 밑 빠진 독에 물 붇기 식의 지원을 거듭한 것이 현재의 경쟁력과 자립성이 낮은 농촌을 만들었다"면서 "이로 인해 농민들은 타성에 젖어있고 정부와 정치권은 농민들에게 끌려 다니기에 바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수출농업과 기술농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장려품목을 지정해 집중적인 지원을 해왔으나 이 정책 또한 우리 농업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세균 박사는 "우리 농산물 중수출경쟁력을 갖춘 폼목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은 수출 위주의 산업이 아니라 국내 소비자 중심의 내수 산업"이라면서 세계적인 추세만 따라가려는 경향을 비판했다.
수출을 위해 특정 품목에 지원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국내 소비가 많은 기초 품목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우리농업의 현실에 대해 "생산이 중요한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진단하고 있다.
소비자 중심으로 판매를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결국 우리농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생산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 중심의 정책으로 일대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마을 단위의 조직화를 통해 공동생산과 공동판매제등을 도입하는 등 마케팅에 역점을 둬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그래서 수익성을 갖출 때만이 우리농업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농업정책도 이에 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FTA협정을 계기로 농림부가 2월중에 발표하겠다는 농업종합대책이 이같은 시대적 요청을 얼마나 반영할지 주목된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