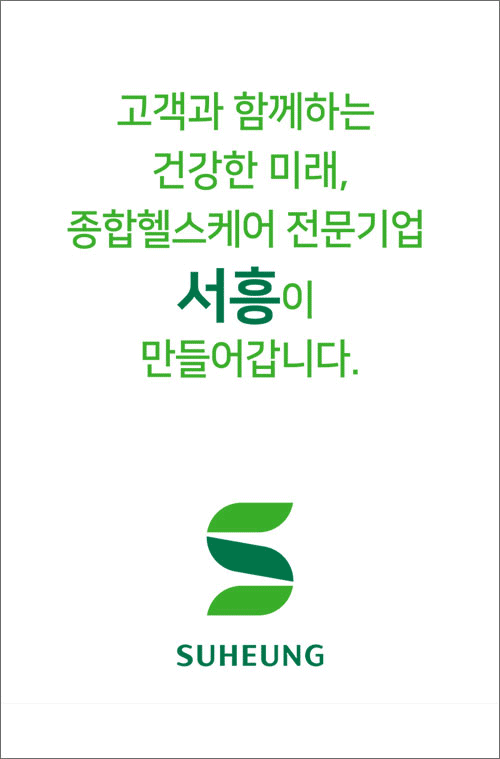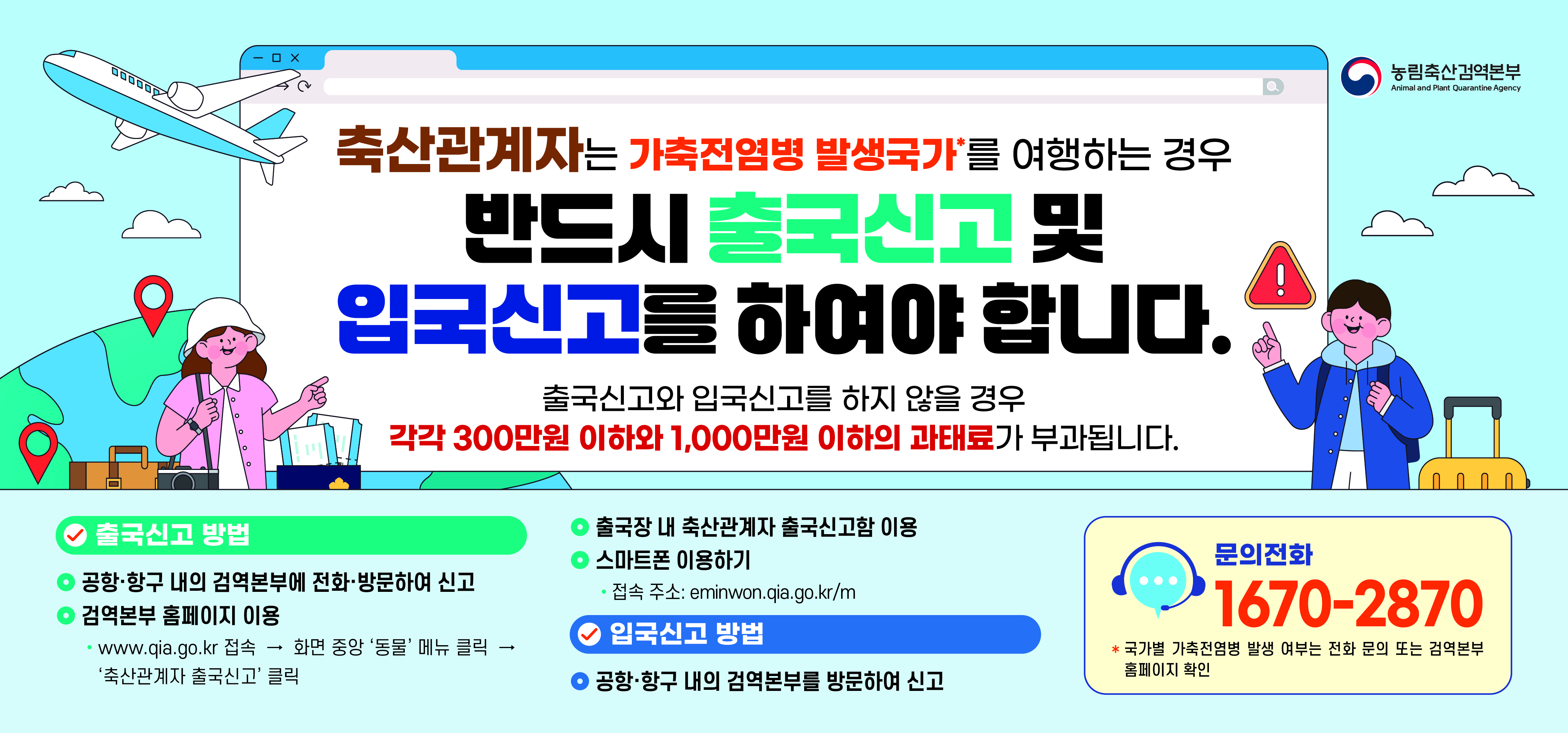지난 11일부터 전국의 65만개 모든 식당은 쌀과 배추김치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고 있다.
또 오리고기와 배달용 치킨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 됐다. 여기에 두부도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5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남자 129명과 여자 92명 등 2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6%는 '1주일에 한 차례 이상 두부를 먹는다'고 응답했다. 나머지 14%도 '2주일 안에 한 차례 이상 두부를 먹는다'고 응답했다.
하지만 두부의 소비량은 소비시장의 웰빙 트렌드를 타고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반해 지난해 우리나라의 콩 재배면적은 7만265㏊로 2008년 대비 6.6% 줄었다.
또 2008년 국내산 콩 생산량은 13만2700t인데, 이 기간 식용·기타 소비량은 48만7000t에 달했다. 거의 대부분의 콩을 원료로 한 식품들이 수입콩으로 만들어졌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농수산물유통공사 등에 따르면 2009년 국영무역으로 수입된 식용콩의 양은 26만4000여t에 달했고 그중 51.4%인 13만5900여t이 두부용 콩으로 시중에 공급됐다.
올해 국내 콩 생산량은 지난해 13만9251t보다 적은 12만3236~13만3984t이 될 것으로 예상돼 소비는 상대적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수입된 콩이나 콩으로 만들어진 두부가 국산콩과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로 소비자들의 앞에 놓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
특히 수입산 대두를 원재료로 시중에 유통되는 두부의 90%는 미국산을 사용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미국산 콩의 대부분이 GMO(유전자변형식품)라는데 있다.
GMO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거친 작물로 그동안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잡초 제거를 하기 위해 농약에 내성을 가진 대두를 보급해 지난 2000년대 들어서 대부분 작물을 GMO로 교체했다.
문제는 두부를 만드는 원재료인 대두 90% 이상을 미국산이 차지하고 있지만, 이 콩이 GMO 콩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수입업자들은 정부의 방침을 이용해 두부 및 유제품에 국적불명의 ‘수입산’이라는 표기만 한 채 관련제품을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 수입산 대두로 두부를 만드는 업체들은 포장지에 ‘대두 미국산 100%’ ‘호주산 100%’ 등 대신 ‘수입산 100%’로 표기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이나 마트에서 두부를 구입할 때는 이런 표시라도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하지만 식당에서 두부를 먹을 때는 소비자들이 이를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두부전문점의 경우 ‘국산콩 100%로 만든 두부’라는 광고와 함께 손님을 끌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수입콩을 원료로 해서 만든 두부인지, 국내산 콩을 원료로 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결국 유전자조작콩을 재료로 쓰면서 ‘직접 재배한 토종 콩으로 만든다’고 속이는 기만적 상행위의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유전자조작콩에 대한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어느 정도인지는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자유선진당 이용희 의원에게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08년 주요 농축수산물 소비패턴' 조사 결과에도 잘 드러난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의 대다수(84.0%)는 콩나물, 두부제품의 주재료가 GMO콩이라고 할 경우 '구입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혀, GMO 식품에 대한 우려감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감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콩·두부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 당국에서도 개인적인 ‘사견’ 수준이지만 콩·두부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데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는 당국자도 나오고 있다.
서해동 농식품부 농산경영과장은 최근 열린 콩 관련 심포지엄에서 발표 자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콩·두부에 대한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제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국내산 콩 소비 확대를 위한 기반 확립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펼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