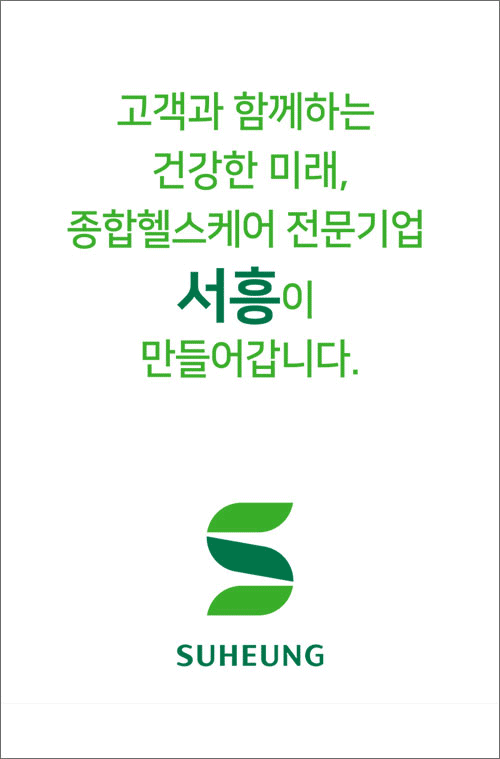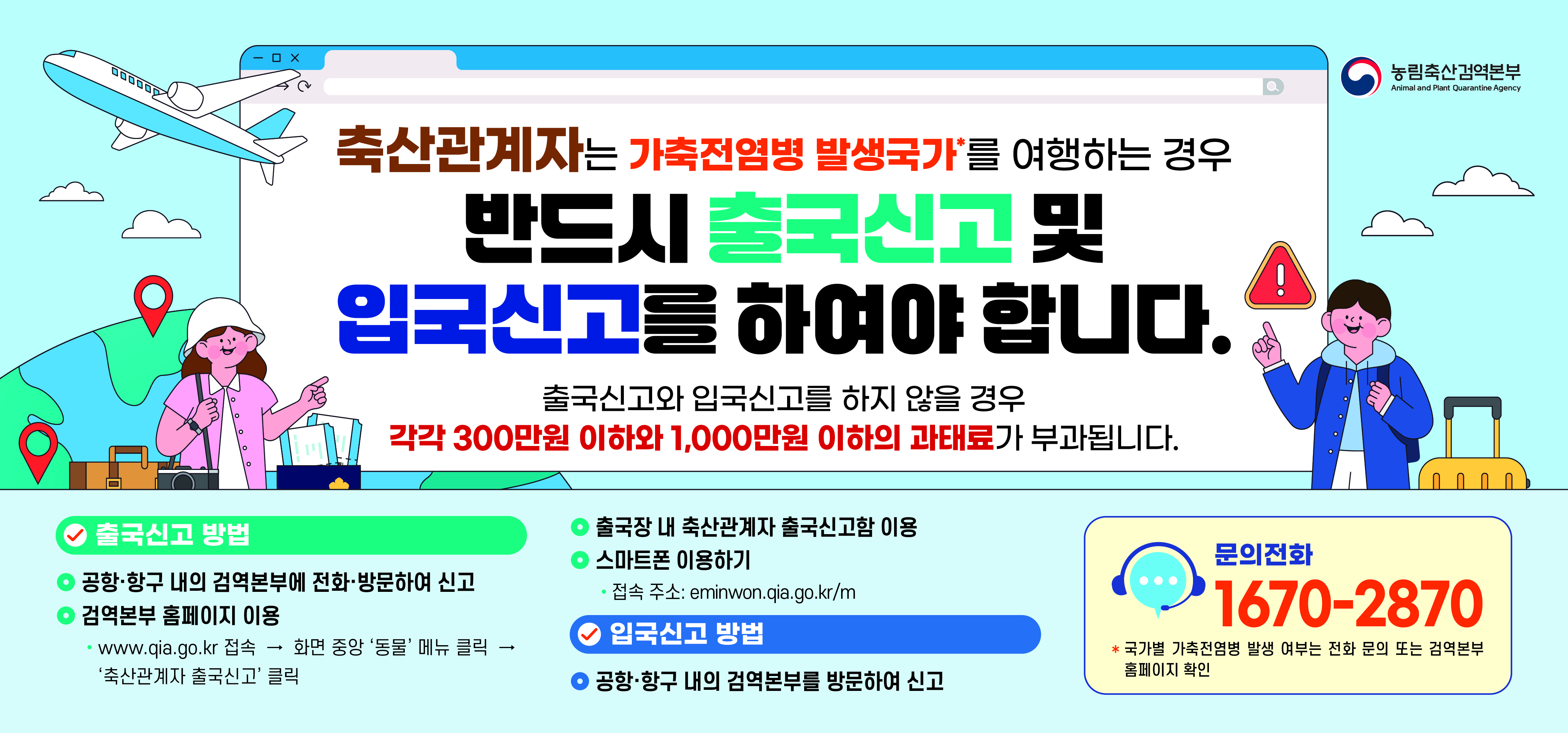음식은 오감(五感)으로 먹는다. 보는 것만으로 군침 돌고, 고소한 향에 지글지글 매혹적인 소리, 입안에서 녹아내리거나 혹은 씹히는 맛까지.
'음식잡학사전'은 분명 ‘음식’에 관한 책이다.
하지만 그 흔한 레시피도, 금방이라도 손을 뻗어 입에 가져가고 싶을 만큼 탐스러운 음식 컬러사진도 없다.
대신 맥주에 관한 대목이 나오면 맥주를 한잔 마셔야 할 것 같고, 자장면에 관한 대목에서는 갑자기 사무치게 자장면이 먹고 싶을 정도로 맛있는 음식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이 책을 펼치기 전에는 미리 배를 든든히 채우고 읽어야 한다.
이 책은 음식의 맛을 묘사한 책은 아니다. 대신 기름기는 쏙 빼고 영양가를 높여 역사, 인물, 유래, 재미있는 자투리 상식까지 음식의 모든 것을 풀어낸다.
음식에 관해 풀어낼 게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은 일단 접어도 좋다.
평소 무심코 먹던 상추에도 ‘체면 효과가 있어 고3 수험생들에게 금기시되는 음식’‘아편과 같은 효과가 있어 진통제로 사용된 상추’‘정력 강화 효과로서의 상추’‘천금채라 불릴 정도로 값이 비싼 와채’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버무려져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수많은 상식과 지식 중에서 특히 ‘음식’을 집중 조명한 그야말로 ‘음식잡학사전’이다.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의.식.주가 하나같이 인간이 걸어온 발자취를 대변하고 있듯이, 음식은 모든 문화의 근간이자 인류 역사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그 문화도 다양하게 달라진다는 것이다.
저자 역시 미식가를 자처하며 일부러 맛있는 집을 찾아다니고 20여 개국을 여행하며 새로운 음식을 맛보면서도 “맛도 맛이지만 현지의 역사와 문화까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고 말한다.
이 책에는 총 70여 개의 음식들이 소개되어 있고, 그 음식들과 관련된 뜻밖의 문화사가 줄줄이 엮여 있다.
각각의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떤 사람들이 즐겨 먹었는지,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등을 추적하면서 음식에 얽힌 유래와 에피소드들을 맛깔나게 풀어낸다.
요즘은 없어서 못 먹는 랍스터가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었을 때는 ‘가난의 상징’이었는가 하면, 짬뽕이 실은 “너 밥 먹었냐?”라는 중국어 “츠판?”을 사투리로 “샤뽕?” 하고 물은 데서 비롯되었다는 이야기 등은 예상치 못한 의외의 이야기라 더욱 흥미롭다.
또한 흰색의 부드러운 빵은 귀족과 시민 계층의 몫이었고 농부들은 딱딱한 검은 빵만 먹었던 시절 ‘빵의 평등권’을 위해 투쟁한 빵의 역사, 가을밤이 되면 양반댁 마님이 은밀히 사랑채로 내가는 ‘사랑의 묘약’인 두부추탕에 관한 이야기들은 음식 한 그릇에 담겨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보여준다.
테마별(역사 속의 한 장면, 원조와 어원, 음식남녀, 전쟁과 도박, 황제의 음식, 건강과 소망)로 소개하는 음식에 얽힌 유래에 귀기울이다보면 현지의 역사와 문화를 배울 수 있음은 물론 직접 음식을 맛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출판사 북로드 펴냄 / 윤덕노 지음 / 343쪽 /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