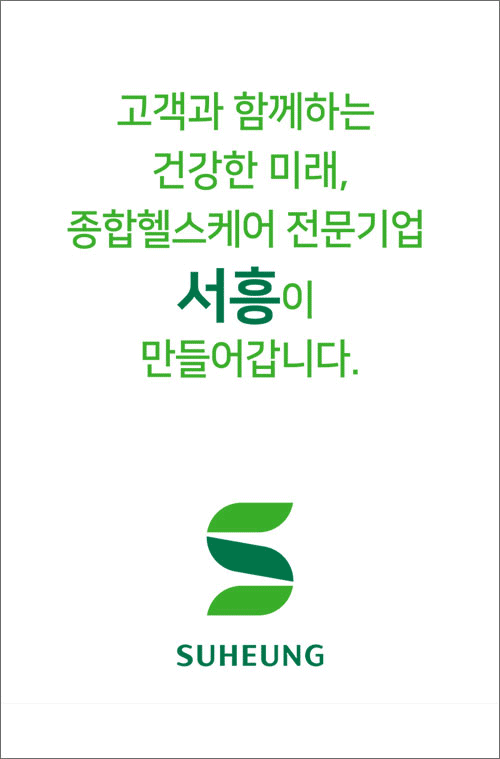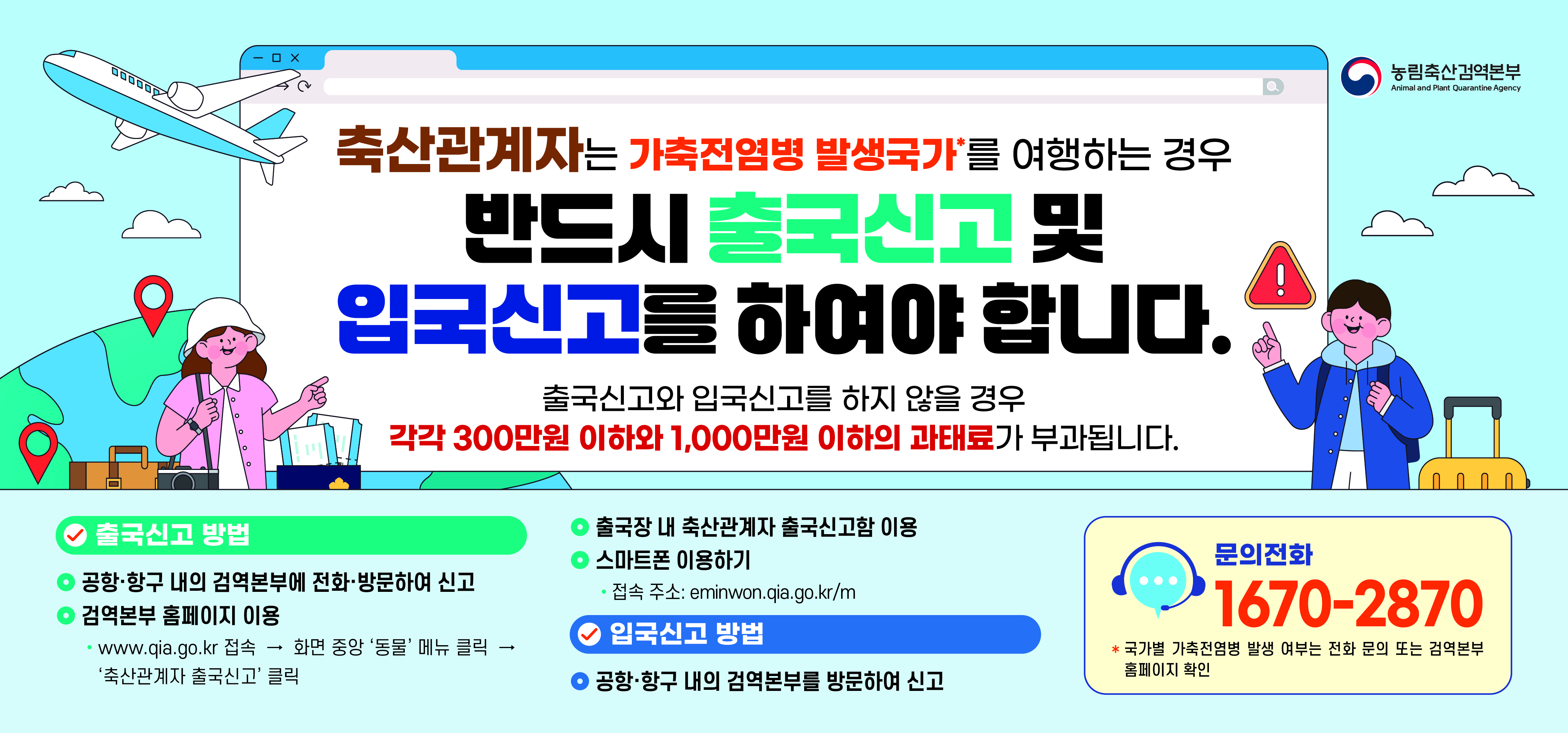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유럽연합(EU)이 즉석섭취식품(RTE: Ready-to-Eat, 이하 RTE)의 리스테리아 규제를 대폭 강화함에 따라 한국 식품 수출기업의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7월부터 시행된 EU 신규 법령 Regulation (EU) 2024/2895는 모든 RTE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내 ‘리스테리아 미검출(0 cfu/25g)’을 의무화하고, 이행 책임을 제조, 포장, 유통, 소매 전 단계로 확대했다. 기존의 ‘100 cfu/25g 이하’ 허용 기준에서 한층 강화된 조치다. 특히 유통과정에서 리스테리아가 검출되면 제조사가 아닌 유통업체에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RTE 식품이란 별도의 조리 없이 바로 섭취할 수 있는 도시락, 샐러드, 냉장 반찬, 베이커리류, 냉동 육가공품 등을 말한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냉장온도에서도 증식이 가능한 세균으로 13~20%에 이르는 치사율을 가진다. 특히 냉장 보관되는 육류 가공품, 치즈, 샐러드, 즉석 도시락 등 RTE 식품에서 자주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3년 유럽 내 리스테리아 감염 사례는 2,700건 이상으로, 유럽식품안전청(EFSA)은 이를 고위험 식품안전 리스크로 간주, 강도 높은 통제를 결정했다.
이번 규제는 EU에 수출 중인 한국산 냉장 도시락, 반찬류, 육가공품, 샐러드 키트 등이 모두 대상이다. 바이어들은 이제 단순한 제품 스펙이 아닌 유통기한 전 구간에 걸친 미생물 안전성 검증 자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생산단계에서 문제가 없더라도 운송 중 오염되거나 유통과정 후반부에 세균 증식이 발생하면 수입 거절, 과징금 부과, 리콜 등 직접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이다. EU 내 등록 취소나 거래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T는 이번 리스테리아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식품 수출기업이 생산 단계에 국한되지 않는 전 과정 위생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핵심 대응 전략이 제시된다.
리스테리아 감염 리스크가 높은 냉각, 포장, 보관 등 공정에 대한 CCP(중요관리점) 재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PCR 기반의 신속검사 키트나 자동화 시스템 등 실시간 검출 기술 도입을 통해 공장 환경 내 미생물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EU는 제조뿐 아니라 유통·소매 전 과정에 위생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만큼 생산부터 물류, 소매까지의 전체 위생 점검 기록 및 유통기록을 문서화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온도 유지 기록, 위생 교육 이력, 제품 샘플 보관 등을 통해 리콜 상황 발생 시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EU 바이어들은 제품 구매 전부터 위생관리 매뉴얼, 미생물 검사 보고서, 공정도 등 사전 자료를 영문으로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계약서에는 유통단계 중 발생할 수 있는 오염에 대한 책임소재 명시 및 사전 협의 조항을 포함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EU 위생 기준에 대응한 제품’이라는 신뢰 이미지 구축은 단순한 위생 관리를 넘어 해외 마케팅의 차별화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 위생 역량을 기술 기반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aT는 “이번 EU의 리스테리아 규제 강화는 단순한 품질 기준을 넘어 식품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위생관리 체계 구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점”이라며 “한국 수출기업은 초기 비용 부담을 넘어 EU 시장에서의 신뢰 확보와 지속가능한 수출 경쟁력을 위한 전략적 투자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생 대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핵심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