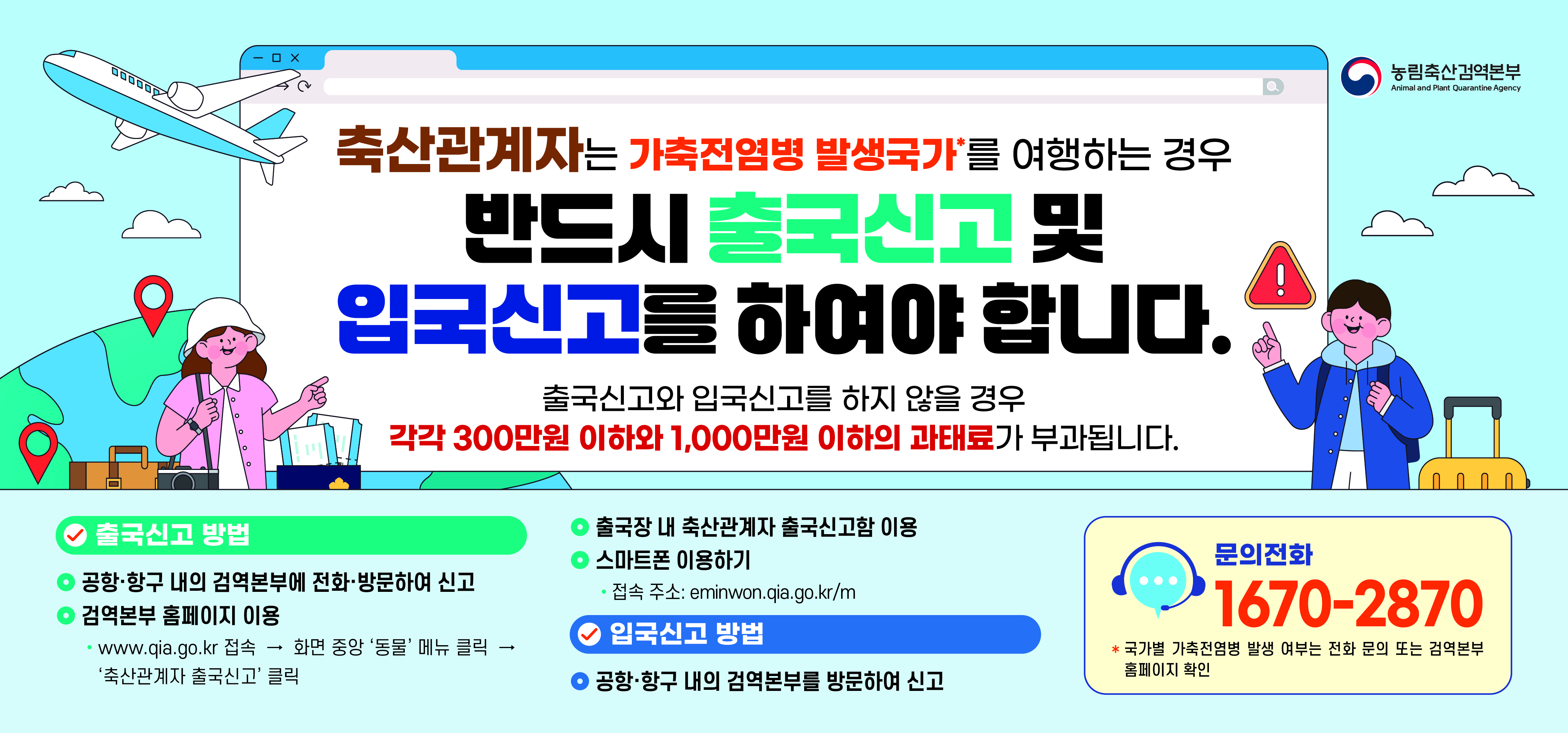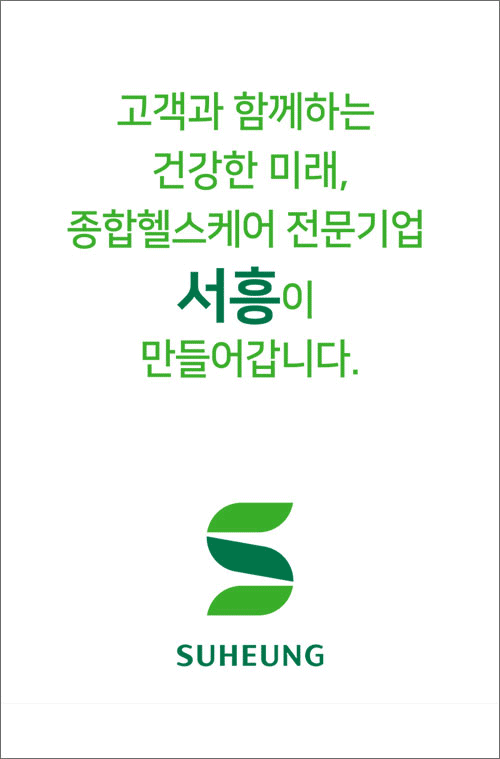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최근 ‘웰빙’ 열풍이 불면서 소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각종 노력들이 유행이다. ‘잘 먹고 잘 살기’란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어야 한다는 뜻이고, 잘 먹어야 잘 살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과연 현대인들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먹는 것이 ‘잘 먹기’인지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때 나름대로 유명한 어떤 의사가 고기를 먹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해서 우리사회에 채식주의가 유행한 적이 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었다. 사람들은 그럴 때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적으로 따라하곤 한다. 심지어 TV 드라마에 소재로 등장한 음식이 실제 시중에서 불티나게 팔리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
‘남이 거름지고 장에 가니 나도 거름지고 장에 간다’는 꼴이다. 필자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 문외한이긴 마찬가지지만, 또 그러하기에 ‘잘 먹기’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먹는 문제는 역사 이래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였다. 예전에는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개인별 체질 특징을 중시하고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이요법이 강조되면서 더욱 그렇다. 특히 인간이 살면서 얻게 되는 질병의 대부분은 먹는 문제로부터 생겨나고 있지만 그렇게 발생한 질병을 현대의학으로는 20% 정도밖에 치료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잘 먹기’가 더욱 중시되고 있다.
이런 차제에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의미 있는 책을 한 권 내놓았다. 조선 세조 4년(1460년)에 어의(御醫) 전순의(全循義)가 편찬한 ‘식료찬요(食療纂要)’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식료찬요’는 한마디로 우리나라 최초, 최고의 식이요법서인 셈이다.
저자 전순의는 식료찬요 서문에 다음과 같이 써놓았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음식이 으뜸이고 약이(藥餌)가 다음이 된다. 시기에 맞추어 풍한서습(風寒暑濕)을 막아주고 음식과 남녀 간의 관계를 한도가 있게 절제한다면 병이 어떤 이유로 생길 수 있겠는가!
그러나 간혹 사계절이 순서를 어겨 이상기후가 있으며, 평일(평온한 날)이 오히려 적고 난일(어지러운 날)이 오히려 많으면 비정상적인 기운에 감응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고인(古人)이 처방을 내리는데 있어서 먼저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선하고 식품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약으로 치료한다고 하였으며, 식품에서 얻는 힘이 약에서 얻는 힘에 비하여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오곡(五穀) 오과(五果) 오채(五菜)로 다스려야지, 어찌 마른 풀과 죽은 나무의 뿌리에 치료방법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것으로 古人이 병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식품으로 치료하는 것을 우선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이 말은 식이요법(食餌療法)의 중요성을 강조한 대목이다.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있어서 먹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저자 전순의의 위와 같은 말 속에는 또 제 나라, 제 땅에서 난, 제 철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돼 있다.
예전에는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중시되었지만 생산된 작물을 어떻게 어떠한 사람에게 사용할 것이냐가 중시되었다고 한다. 즉 농학과 한의학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으로 간주된 것이다. 1909년에 출간된 장지연(張志淵)의 농학신서(農學新書) 등의 농서에서도 작물의 한의학적 효능이 나와 있으나, 서구농업이 도입된 이후 한의학적 효능이 배제된 것이 불과 100년 남짓하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전순의가 편찬한 ‘식료찬요’는 위기에 처한 우리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너나 할 것 없이 웰빙을 추구하고 있고, ‘기능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으면 팔리지 않을 정도인 오늘날 세태에서 ‘식료찬요’는 우리에게 소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 책을 쉬운 한글로 번역해 낸 농촌진흥청은 번역 자체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귀중한 이 자료가 널리 국민들에게 전파돼서 제대로 된 ‘잘 먹고 잘 살기’의 길잡이가 되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식품업체 역시 기능성 소재를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식료찬요’의 식이요법을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나는 우리 농산물에서 기능성 원료를 발굴해내는 연구에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기업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일에 적지 않게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내 농업을 살리고, 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나아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는 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