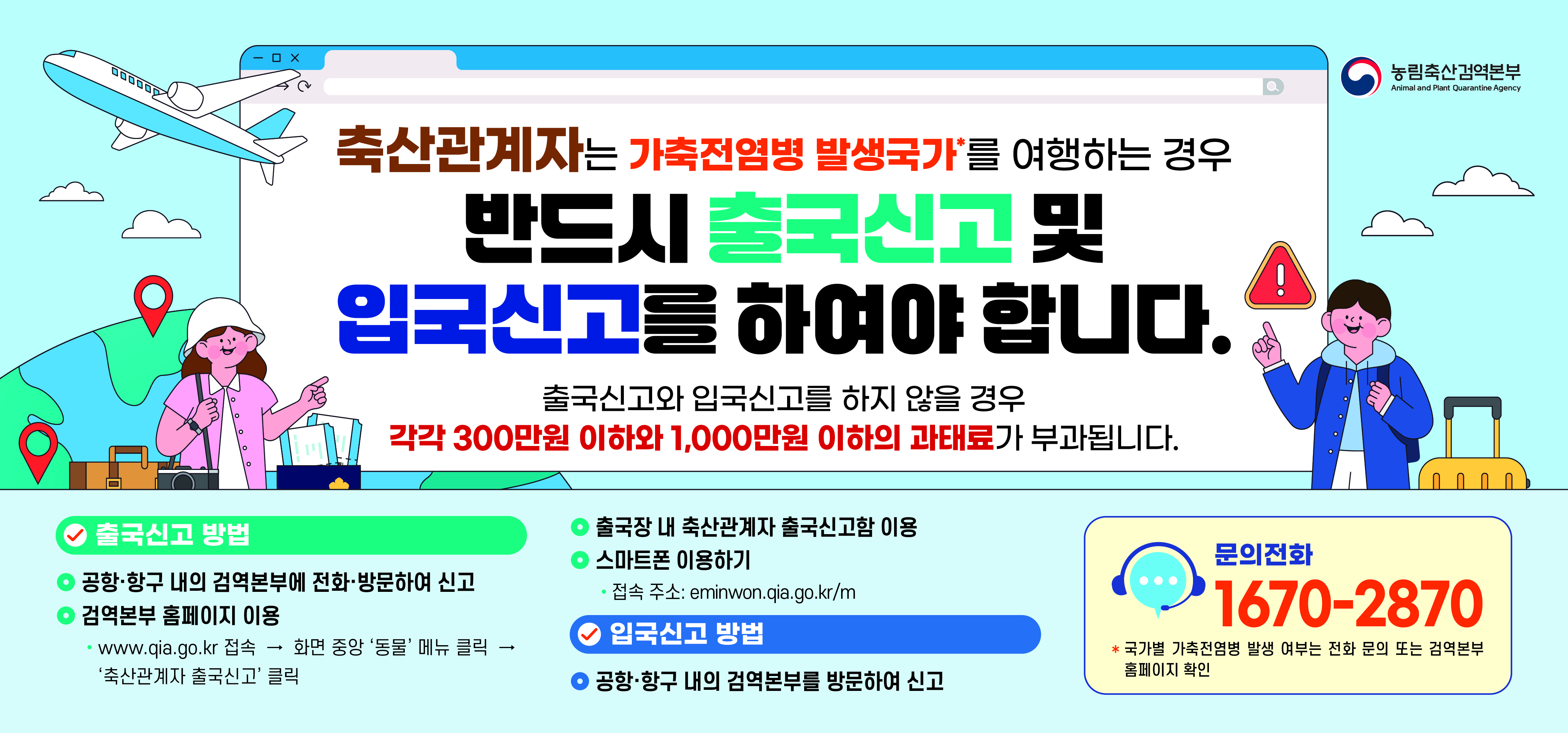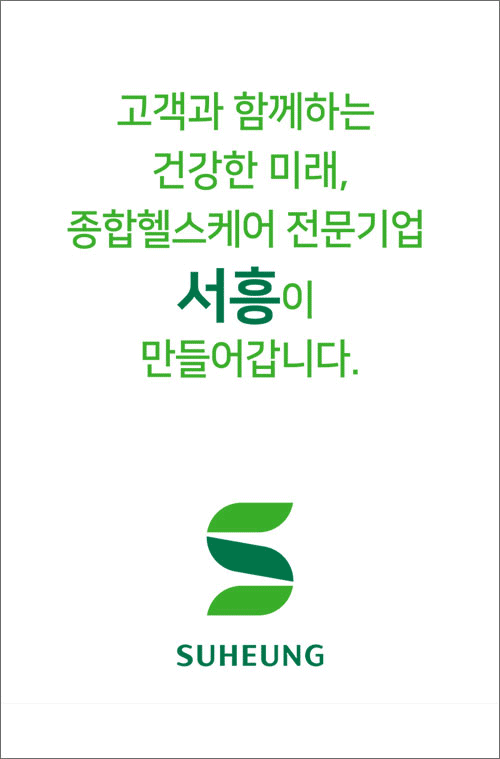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탄핵정국을 계기로 한국사회의 불안과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나라의 주인도 없고 어른도 없어 보인다. 법질서도 무너진 느낌이다. 일반 국민들은 도대체 뭐가 뭔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다. 불황으로 가계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고 이혼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살이 속출하고 있다. 지금 한국사회는 마치 겉은 멀쩡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단물은 빠지고 퍼석퍼석한 바람 든 무와 같다. 국민에 의해 선택된 나라의 어른인 대통령은 탄핵 심판대에 올려져 ‘식물 대통령’이 돼있고 국민적 어른으로 추앙받던 종교지도자마저 교단 내부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변화가 너무 급격하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 민주화 과정에서 겪은 변화보다도 오히려 강도가 더 세다는 느낌이다. 무엇을 위한 변화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혹자들은 지금 한국사회는 혁명적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총칼 없는 ‘시민혁명’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총칼로 하는 유혈혁명이든 총칼 없는 무혈혁명이든 혁명은 반드시 부작용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과거를 모두 부정하고 기성세대를 무조건 부정하는 식의 혁명은 쿠데타이던 시민혁명이든 바람직하지 않다. 부정은 반드시 또 다른 부정을 낳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아버지 없는 자식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아무리 개망나니일지라도 자식이 반드시 개망나니가 되는 게 아니다. 아버지가 개망나니일지라도 자식이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반듯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이치다. 그러나 아버지를 부정하는 자식은 역시 개망나니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교육과 학습의 차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모습이 마치 자식이 개망나니 아버지를 부정하는 꼴과 흡사하다. 과거를 돌아보고 내일의 발전을 모색하려는 생각보다는 과거를 부정하려는 경향이 너무 강하다. 필자는 이 모두가 그동안 타협과 조화가 아니라 흑백논리의 정치를 해온 정치권에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고 평가한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사회에서는 갈등구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념간의 갈등, 계층간의 갈등, 세대간의 갈등, 빈부간의 갈등 등 다양한 갈등이 상존하게 마련이다. 갈등이 있어야 발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갈등구조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 갈등구조를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흑백논리로 또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는 순간적으로 갈등을 해소할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해 궁극적으로는 갈등을 오히려 심화시킬 뿐이다.
특히 흑백논리에 의한 갈등 해소 방식은 급격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정치적 상황이든 경제적 상황이든 급격한 변화는 국민들에게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만들고 이는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마련이다. 자살, 이혼, 범죄 행위 등이 바로 그런 것이다. 모름지기 변화는 국민들이 알 듯 모를 듯 하게 서서히 일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혁명적 방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혁과제에 대한 국민적 공담대가 형성돼야 한다. 위정자와 국민들의 생각이 비슷해야 하고 계층간, 세대간에도 서로 상대의 입장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국민 대다수의 여론과 상관없이 정치적 이유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고, 또 국민들은 이를 빌미로 분풀이 하듯이 인물이나 정책과 상관없이 선거에서 특정 정당을 무조건 밀어주는 식의 방법을 택해서는 결코 갈등을 치유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4.15총선에서 소수 여당이 졸지에 거대 여당으로 둔갑하거나 국회의 대통령 탄핵결의가 헌법재판소에서 가결되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경우 한국사회에 몰아칠 태풍이 역사 이래 그 어느 때보다 무서운 태풍이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