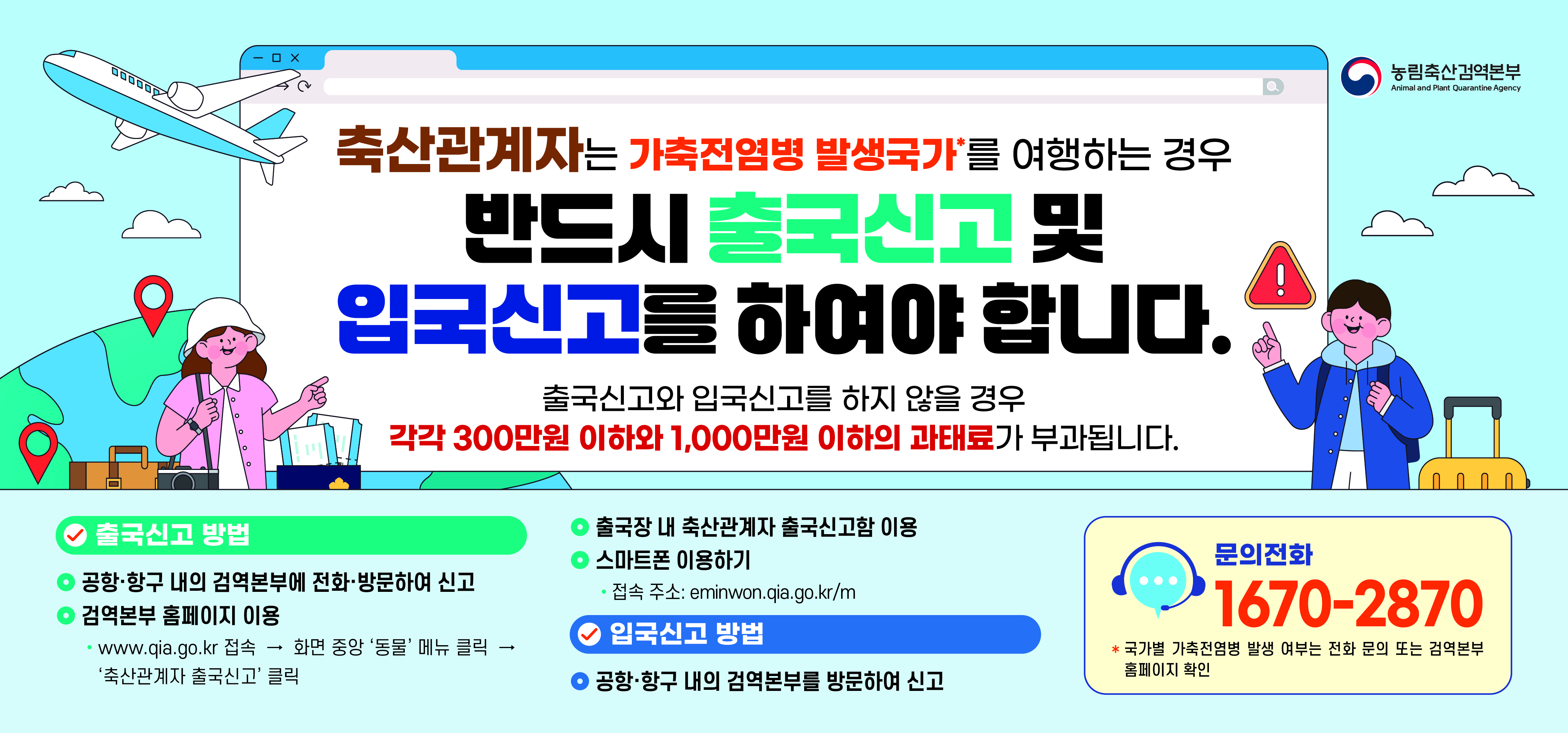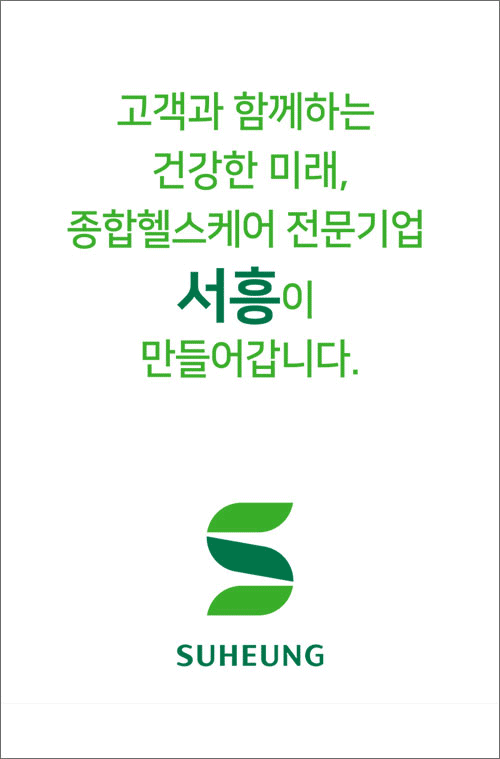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해야 할 때도 있지만 구분하기가 모호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분하지 말아야 할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은 권선징악을 기본 정신으로 하고 있지만 독자가 등장인물 중에 어느 쪽이 선이고 어느 쪽이 악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작품이 영구불멸의 작품으로 꼽힌다. 소설 <모비딕>(백경)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다. 내용의 줄거리는 고래잡이 배의 선장인 에이브리함 선장이 어느 날 백경(흰고래)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한 쪽 다리를 잃고 자신을 공격한 백경을 죽이기 위해 모든 걸 거는 무모한 복수극을 벌이는 내용이다. |
문학작품은 저자가 탈고를 해서 세상에 던져지는 순간부터 독자의 것이다. 저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평가는 독자의 못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영구불멸의 명작들은 대부분 ‘선’과 ‘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유는 독자, 즉 인간은 각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환경적 동물이다. 환경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게 마련이다. 환경이 바뀌어도 쉽게 변하지 않으면 ‘진득하다’고 하거나 ‘둔하다’고 평가하고 쉽게 변하면 ‘변덕스럽다’ 또는 ‘발 빠르다’고 말한다.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사회에서는 대부분이 눈에 보이는 이익을 좇아 움직이게 마련이다.
정치인은 표심과 민심에 따라 움직이고 기업인은 회사 이익을 따라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돼있다. 인생의 목표나 대의명분조차 바뀔 때가 있다. <모비딕>의 주인공 에이브리함 선장도 마찬가지였다. 작품속의 그는 최고의 고래잡이꾼이었다. 그래서 항상 선주들에게는 높은 몸값의 스카웃 대상이었다.
그러나 그런 그도 백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한쪽 다리를 잃고서는 이성을 잃었다. 선주를 위한 고래잡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백경을 향한 복수심에 불탔고 끝내는 부하들로부터 외면까지 당한 채 불행을 자초했다.
최근 우리 정치판에 정동영과 박근혜, 또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라는 두 주인공이 등장했다. 국민들은 불멸의 문학작품을 읽는 흥미 못지않은 시선으로 두 주인공의 ‘정치놀음’을 즐기고 있다.
열린우리당이나 한나라당 중 어느 한쪽을 아예 선 또는 악으로 못 박고 사생결단 식의 응원을 하는 국민이 있는가 하면 ‘정치놀음’의 흥미에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국민들도 있다. 주인공들도 마찬가지다.
탄핵정국에서 울분을 터트리며 일괄 의원직 사퇴를 제출했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전세가 역전되고 국민적 지지가 상승하자 슬그머니 의원직 사퇴를 철회했다.
벼랑 끝에 몰렸던 한나라당은 박근혜 체제로 새 출범하면서 자기네들이 언제 기득권 세력이었고 감히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호화정당’이었냐는 듯이 천막당사를 꾸미는 등 ‘쇼’를 하고 있다. 모두가 환경이 바뀌니까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꼴들이다.
이들에 대한 평가는 4.15총선에서 내려지게 돼있다. 투표로써 정치적 의미의 ‘선’과 ‘악’의 판가름은 나게 돼있지만 국민적 여론조차 선과 악으로 양분돼는 양상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민주사회는 다양성의 사회다. 각자의 입장을 존중함으로써 다양성이 공존할 때 제대로 된 민주사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는 다양성이 인정되기 보다는 ‘선’과 ‘악’을 구분 지으려 하고 흑백논리로 문제를 풀려는 경향이 너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김병조 편집국장/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