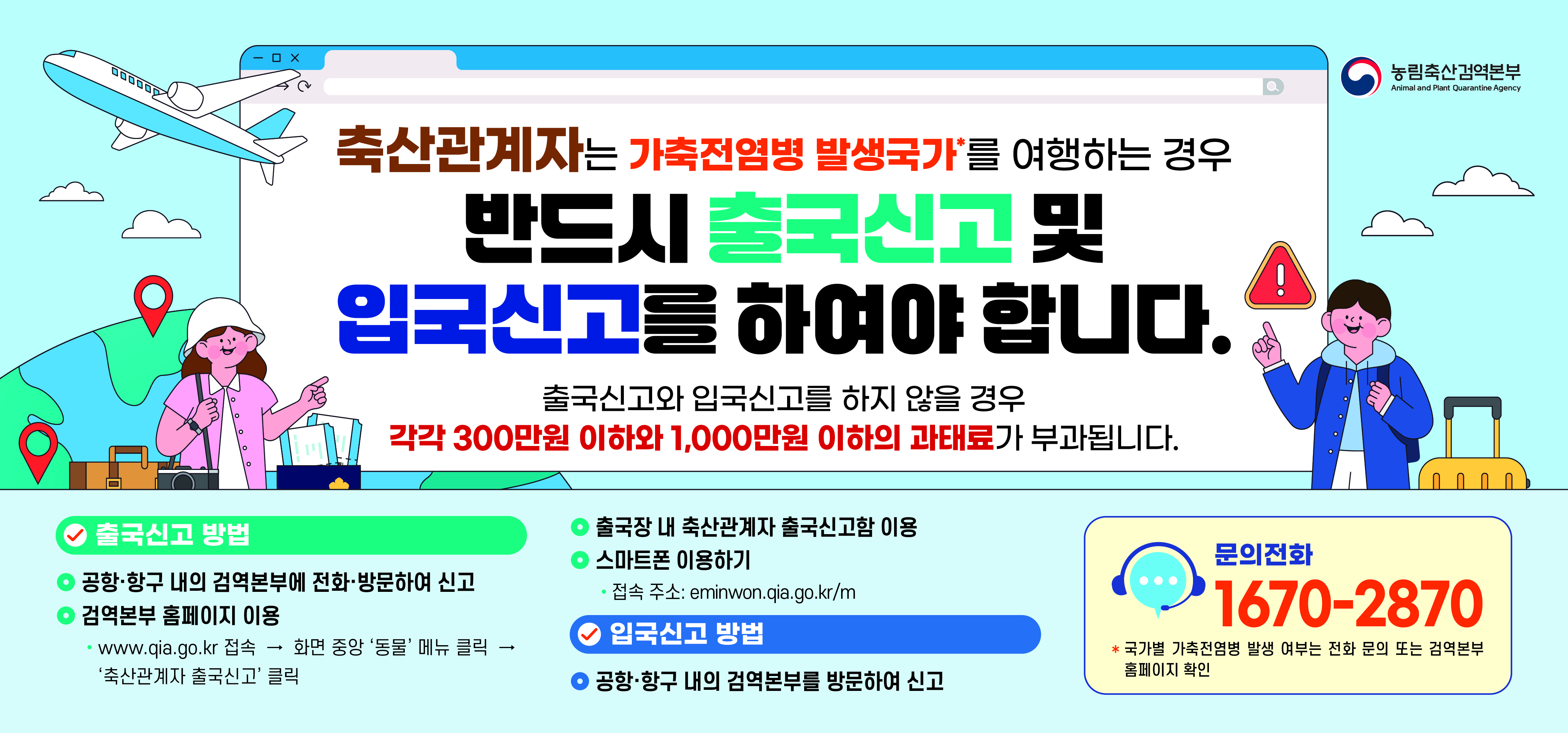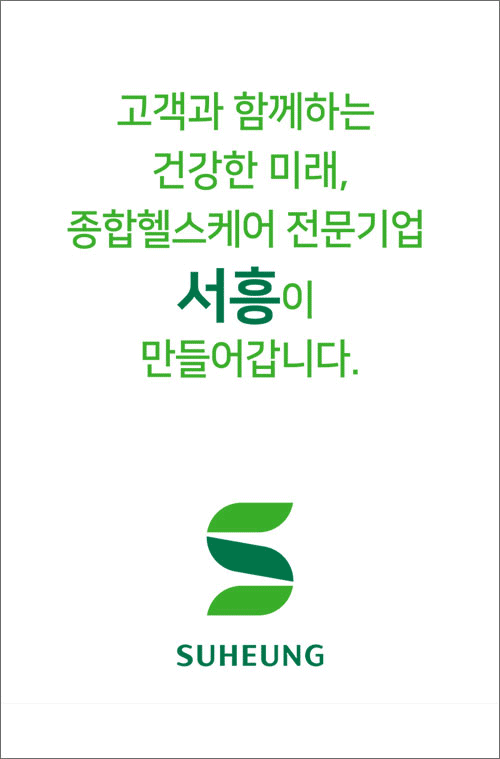풍요속의 빈곤 심화, 엉뚱한 ‘호화 웰빙’ 횡행
‘더불어 잘 사는’ 진정한 복지정책 절실우리나라 인구 4천8백50만명 중에 빈곤인구는 4백6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9.8%에 이른다. 정부의 공식 통계다.
보건사회연구원이나 학계의 주장으로는 전체 인구의 16%인 7백72만명이 빈곤층이다. 이로 인해 끼니를 거르는 성장기 아동수가 17만명이나 된다. 아이를 굶기면서 배를 채우는 부모가 없다고 가정할 때 밥을 굶는 인구는 수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또 우리나라의 전체 주택보급률은 100.6%나 되지만 무주택 가구수는 41.1%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총가구수는 1천4백31만여 가구. 그 중에서 112만 가구는 단칸방살이를 하고 있고 167만 가구는 2칸짜리 방살이를 하고 있다.
2003년도 우리나라의 식중독 사고는 135건 발생에 7천909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년전에 비해 건수로는 73%, 환자수로는 무려 165%나 증가했다. 게다가 부정불량 식품은 시도 때도 없이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 식품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이나 식당 등은 5만8천여건으로 하루 평균 1백59건이나 됐다. 수법도 비인간적인 차원을 넘어 악랄하다. 폐수처리용으로 도라지를 씻고 화장실 세척용으로 횟감을 세척하는 정도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방자치제 이후 표를 의식한 지자체의 정치논리에 의해 단속의 칼날은 무딜 대로 무뎌져 있다. 95년까지 연간 1백만건 안팎이던 식품사범 단속 건수가 지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96년부터 급격히 줄어들어 2002년에는 58만건에 불과했다.
환경적으로도 대기오염, 특히 대기중 미세먼지로 인해 수도권에서만 연간 1만1천여명이 조기사망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이것이 세계에서 10위권의 경제대국이라는 우리나라의 생활환경 수준이다.
이러고도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지난해부터 우리사회에는 이른바 ‘웰빙’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그러나 가진 자들이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왜곡된 ‘웰빙’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보장적 ‘웰빙’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간의 생활의 차이는 불가피하지만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국가인 이상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 많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맹점이 아닐 수 없다. 또 10위권의 경제대국에서의 사회복지수준은 70위권에 머물고 있고 아직도 먹고 사는, 인간의 기본적인 생활문제조차 해결못하고 고민하는 인구가 많다는 것은 국가의 보건정책이 크게 잘못됐음을 반증하는 증거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국민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복지정책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경제대국에 걸맞게, 그리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국가 이념에 맞게 정책의 기본 틀을 획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참여정부 복지정책 문제 많다.
복지정책 철학 부재, 숫자 놀음에 급급
서민 대변 자청 노대통령, 진정한 ‘웰빙’ 정책 제시해야
진정한 선진국은 어떤 나라인가. 경제규모가 크다고, 국민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아니다.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복지국가가 진정한 선진국이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필수적인 의,식,주 문제만큼은 걱정하지 않는 나라라야 선진국이랄 수 있다.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국가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우리나라는 어떤가. 경제 규모로는 세계 10위권을 자랑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수준은 70위권에 불과하다.
사회복지 수준 탑 랭킹에 들어가는 스웨덴이나 덴마크, 노르웨이 등의 경제규모는 30위~50위권 사이에 있다.
이는 국가가 잘 살아야만 국민의 복지 증진을 높이는 것은 아니라는 증거다.
국가가 추구하는 이념의 문제이자 정책의 문제이다. 그리고 국민 의식의 문제다.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까지는 개발과 성장 중심의 이념과 정책으로 인해 복지문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80년대의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외계층의 욕구분출이 봇물 터지듯 일어났고 90년대부터는 분배의 개념, 복지의 개념이
정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자연스럽게 형성된 상황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환경, 특히 복지 관련 환경은 너무나 엉망이다.
전체 인구의 20% 가까이가 기초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세민이다.
특히 이들은 사회 구조상 가난을 대물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욱 심각한 문제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각종 제도와 환경 때문에 가난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어섰지만 10가구 중 4가구 이상은 아직도 자기 집 없이 남의 집에서 셋방살이를 하고 있다.
열심히 벌어도 오르는 집세를 감당할 수 없으니 내 집 마련이 쉽지가 않다.
먹고 살기에 급급한 적지 않은 규모의 빈곤층은 물론, 개발시대에 운 좋게 부자가 된 졸부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이 도덕불감증에 빠져있고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생명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화’에 부정과 불량이 판을 치는 등 나만 괜찮으면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 않는 식의 이기심이 팽배해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가 내놓은 ‘참여복지 5개년 계획’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정부는 이번 계획과 관련해 참여복지의 정책목표로 전국민에 대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제공과 상대빈곤 완화, 풍요로운 삶의 질 구현을 내세웠다고 밝혔다. 또 복지 개념을 확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가 개입할 폭을 넓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따지고 보면 기존의 정책에서 숫자만 조금씩 달라졌을 뿐 새로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
더욱 중요한 것은 복지 정책의 철학이 없다는 것이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현재의 140만명에서 20~30만명 더 늘리고 복지시설 몇 개 더 늘리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은 스스로를 서민의 대변자라고 했다.
IMF 이후 중산층이 무너진 가운데 아주 잘 사는 사람과 아주 못 사는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상존하는 현실에서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소외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열심히 살면 인간다운 삶을 살수 있다는 희망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불어 잘 사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 차원의 ‘웰빙’ 정책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경제규모 10위권 국가에 어울리지 않는 미개하고 저급한, 국민의 안락한 생활환경에 저해가 되는 요소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척결해나가는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
편집국장 김병조/bjkim@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