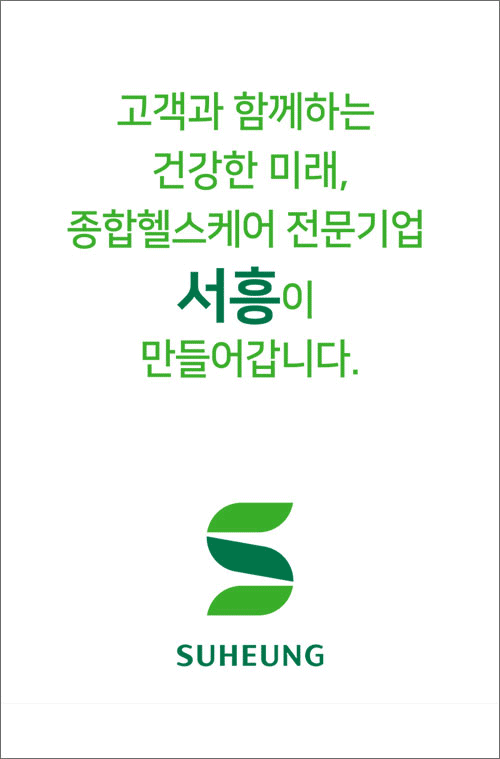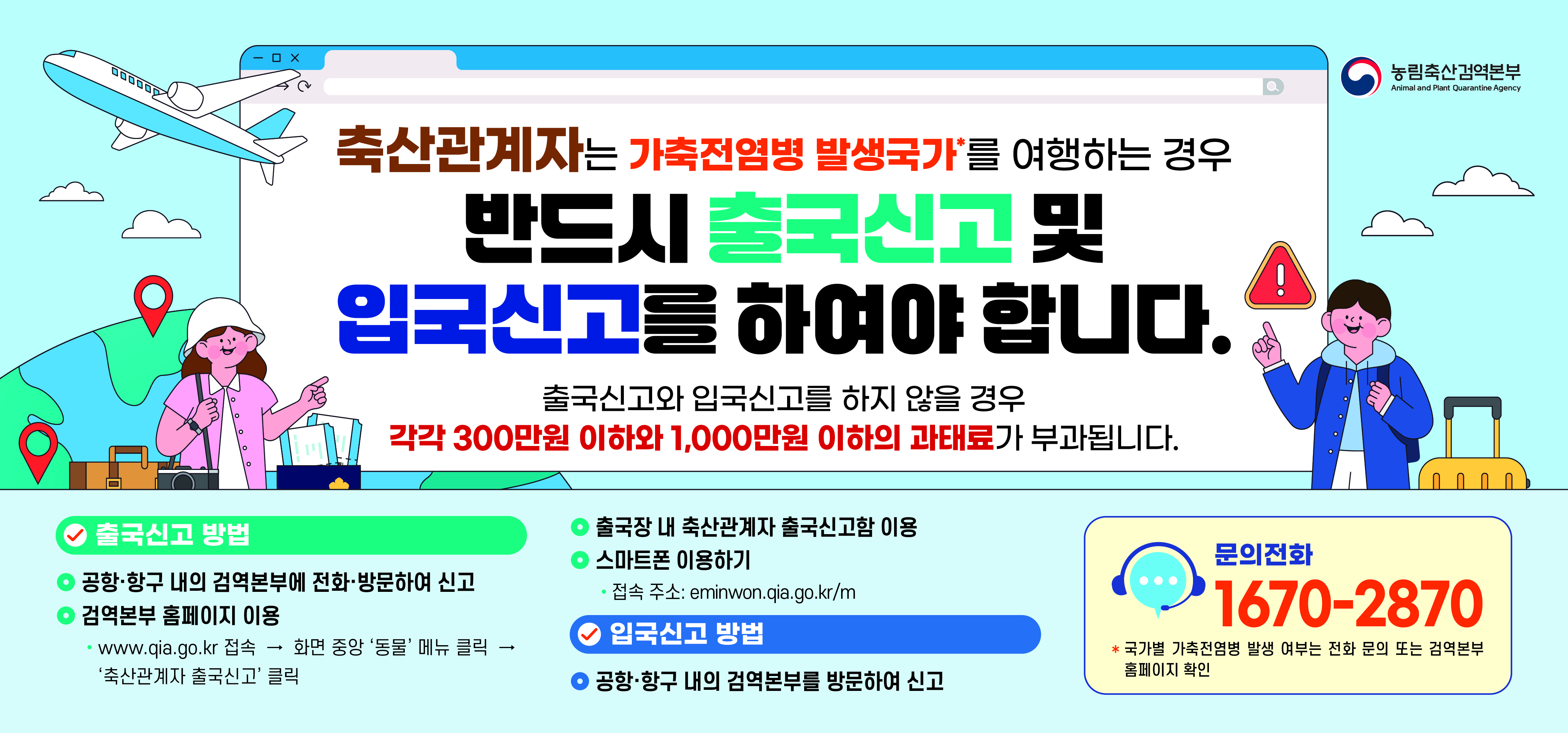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장애인 정책, '시설보호'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 '시설보호'에서 ‘탈시설’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향으로”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이 발의돼 장애인들의 기초수급권 확대의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장애인이 시설에서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로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로 인해 기초수급권이 박탈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시설수급 장애인은 605개 시설에 21,042명이 거주하고 있다.
시설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장애인들의 오랜 숙원이다. 지난해 11월 ‘기초법 개정을 위한 수급자 증언대회’에 나왔던 A씨는 “시설 안에서 죽는 날 만 기다린다”고 했다. A씨는 9살부터 시설에서 20년이 넘게 생활하다 최근 자립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다 포기한 경우다.
A씨는 부양의무기준이 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시설에서 나오는 순간,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를 통해 수급자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에게 부담을 지울 수 없어 어쩔 수 없이 시설에 남게 된 것이다. 시설수급자가 자립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로 연계되지 않으면 대다수 장애인들은 A씨처럼 평생을 시설에서 생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화재로 안타까운 생을 마감한 김주영씨는 성동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을 위해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시켜 달라는 활동을 해왔다. 또 부양의무자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71일째 광화문에서 농성도 진행 중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1, 2급)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수급권을 부여하도록 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통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사회인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했다. 중증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의료비 등 추가 비용의 부담이 커서 부양의무 기준을 넘는 소득의 가족이라 해도 그 부담이 아주 크다.
시설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재가 중증장애인의 경우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부양을 받으며 생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부모가 사망하거나 나이가 많아 자식을 돌보지 못하면 결국 시설로 보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정부의 자립지원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장애인연금법에 의해 지원받고 있는 중증장애인 31만여명 중 이미 수급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 14만명을 제외한 최대 17만명이 기초수급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익 의원은 “장애인 정책이 '시설보호'에서 ‘탈시설’을 통한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며 “소득과 재산이 없는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기초법상 ‘부양의무자’ 적용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1월 보건복지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해 정부가 제출한 2013년 예산안 심사와 연계해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