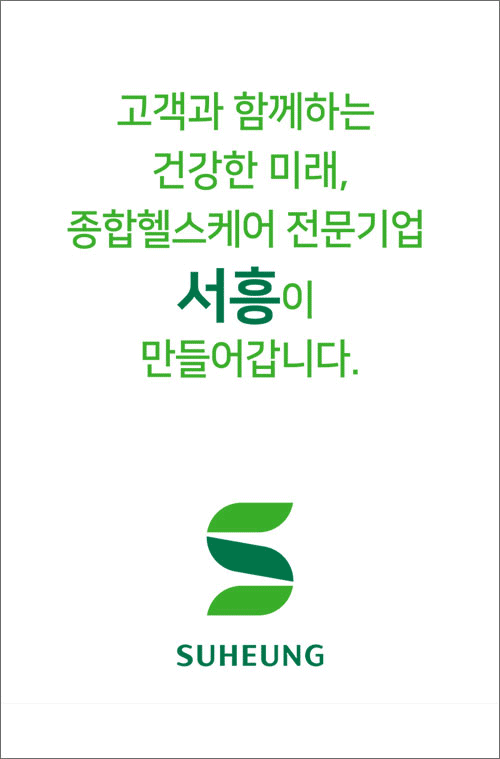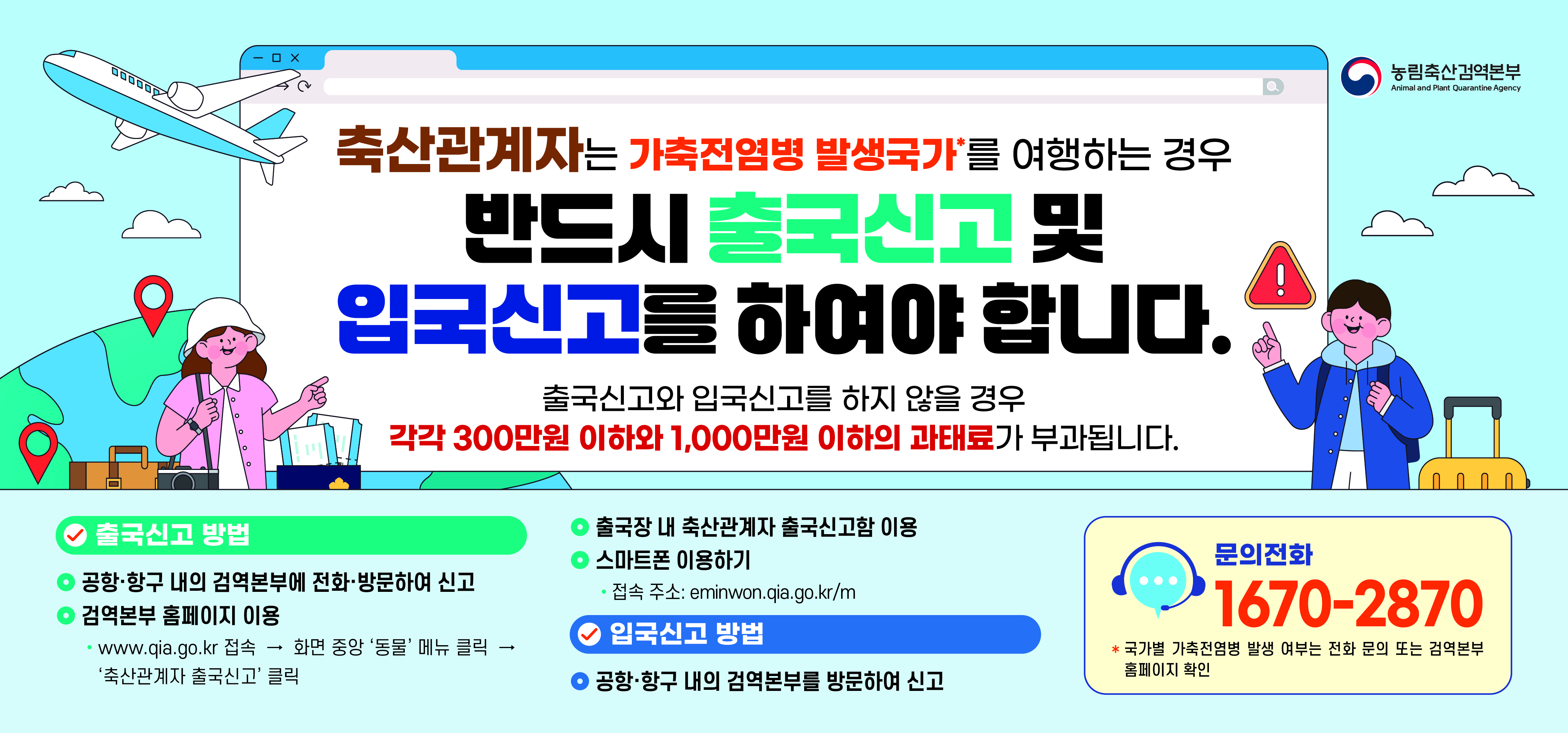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핵심 과제로 ‘스마트 해썹(Smart HACCP)’ 확산을 제시했지만, 중소 식품업체 현장에서는 도입을 둘러싼 고민이 여전히 깊다.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설비·전산·비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망설임이 이어진다.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은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중요관리점(CCP) 관리부터 식품 테러·가짜 원료 사용과 같은 고의적 식품사고까지 예방 범위를 넓히겠다는 취지의 제도다. 다만 이러한 제도적 확장성이 중소업체의 실제 도입 여건과는 간극이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나온다.
“실시간 감시? 아니다…핵심은 자동 기록”
5일 해썹 컨설팅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해썹에 대한 가장 큰 오해는 ‘식약처가 공정을 실시간으로 들여다본다’는 인식이다.
한 컨설팅업체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은 제조공정을 자동화해 중요관리점(CCP) 기록을 자동으로 남기는 체계”라며 “정보 보호 관련 법령 때문에 감독기관이 업체 시스템에 접속해 즉시 열람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중요관리점(CCP) 관련 데이터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수집되며, 해당 정보는 업체의 자체 서버나 클라우드 시스템에 저장된다. 감독기관은 필요 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확인을 통해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스마트 해썹은 감독기관의 실시간 감시를 강화하는 제도라기보다는 중요관리점 기록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제도다.

늘어나는 관심, 그러나 첫 관문은 ‘설비+전산’
중소업체의 관심은 예전보다 분명히 늘었다. 문제는 여전히 도입의 문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을 도입하려면 자동 측정 설비는 물론 이를 관리할 전산 시스템까지 함께 구축해야 한다”며 “소규모 업체 입장에서는 설비와 시스템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자동화 설비 투자, 전산 인프라 구축, 유지·관리 비용을 가장 큰 부담으로 꼽는다. 이 세 가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하는 구조 자체가 스마트 해썹 도입의 가장 큰 장벽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입 검토가 이어지는 이유는 정책 유인 때문이다. 식약처는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설비 구축비 지원, 정기 조사·평가 면제, 연장 심사 가점 등 인센티브를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올해 전문 인력 부족과 비용 부담으로 스마트 해썹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업체 50곳을 선정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화 설비 등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2천만 원이며,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30%씩 투입되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국민 다소비 식품인 음료류를 대상으로 스마트 해썹 선도모델을 새로 개발해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빵류(2022년), 김치류(2023년), 과자류(2024년), 냉동식품(2025년) 등에 대한 선도모델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온 만큼 업종별 확산 전략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해썹 컨설팅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 해썹 도입을 검토하는 업체는 점차 늘고 있다”면서도 “지원사업을 활용해 초기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