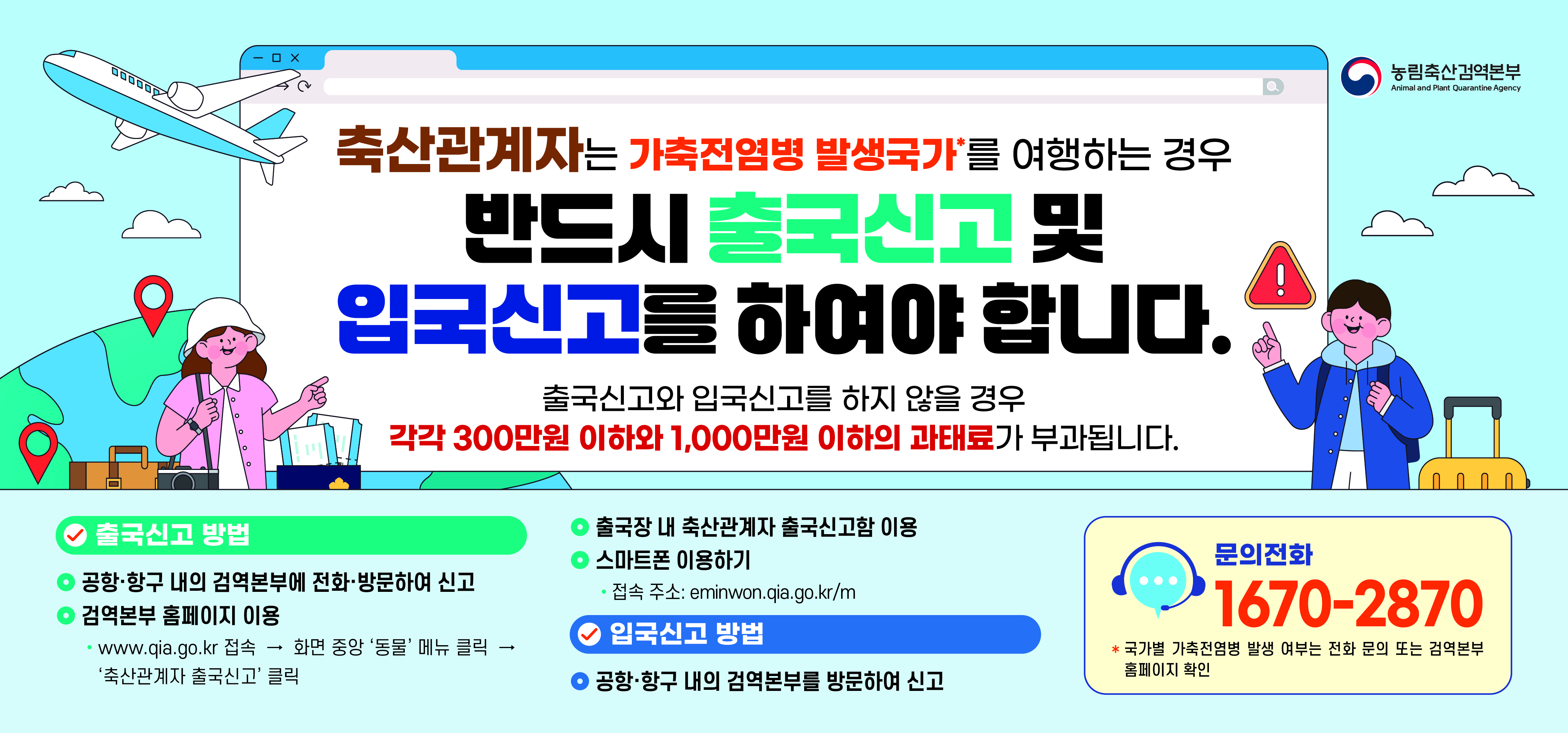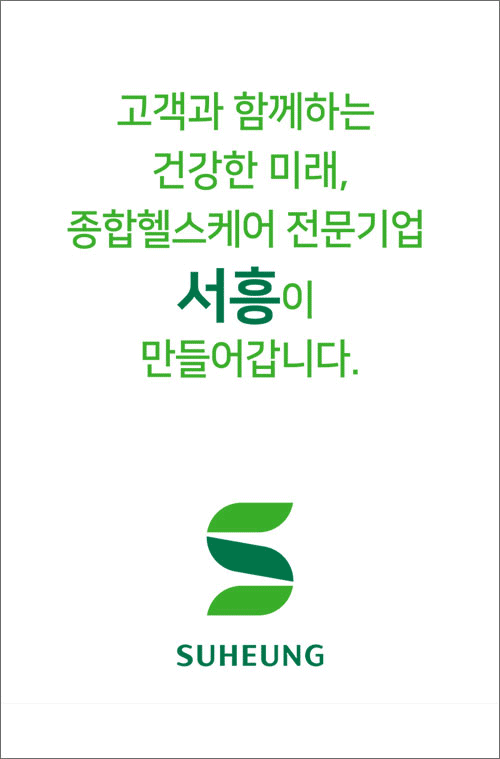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 어릴 적 어머니가 ‘인생은 남을 위해 사는 것’이라고 한 말씀을 기억한다.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관계에서 이런 저런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면서 어머니의 그 말씀이 무얼 의미하는지 어설프게나마 아는 정도는 됐다. 인간은 더불어 산다. 서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산다. 그 속에는 물적 심적 영향이 모두 포함된다. 그래서 교육의 최대 목표는 더불어 잘 사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남에게 악영향을 주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롭게 하며 사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의 목표다.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의 경우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학교 교육현장은 어떠한가. 최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교육현장의 기부문화 인식 및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조사결과 초등학생 10명 중 7명은 ‘어려운 이웃을 모른다’고 응답했고 절반 이상이 어려운 이웃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모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곳곳에 결식아동이 즐비하고 급식비를 내지 못하는 친구들이 같은 학급 내에서도 적지 않을 텐데 70%가 어려운 이웃을 모른다고 한 것은 한마디로 아이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가고 있는 주위에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나밖에 모르는 풍조가 어릴 때부터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족은 유난히 ‘우리’를 강조하는 민족이다. 심지어는 자기 마누라를 칭할 때도 ‘우리 마누라’라고 할 정도다. 그런데 실상 따지고 보면 진정한 의미의 ‘우리’의 개념은 찾아보기 힘들고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들만 난무한다. 자기 자신 또는 자기 가족, 자기 회사, 자기 지역만을 생각하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넓은 의미의 ‘우리’가 아니라 집단이기적인 ‘우리’ 개념만 존재할 뿐이다. 반대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미국 등 서구사회는 어떤가. ‘우리’를 강조하는 우리들보다 그네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서구인들의 더불어 사는 삶의 철학은 유 퍼스트(You First) 정신에서 비롯된다. 그네들은 말 자체에 유 퍼스트 정신이 베어있다. ‘I and You’가 아니라 ‘You and I’이며 ‘Take and Give’가 아니라 ‘Give and Take’라고 한다.
서구인들의 이 같은 남을 우선 생각하는 정신은 기부문화로 이어져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들을 위해 재산을 쾌척함으로써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가 되고 있다. 세계 최대의 갑부인 미국의 빌 게이츠 부부는 지난 5년간 보유자산(460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54%(229억 달러)를 사회에 기부했다.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27조 원이나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 ‘아름다운 재단’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총 기부금은 6천억 원에 불과하다. 2002년 전경련이 37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375개사 총 기부금이 6천7백억 원 밖에 되지 않았다.
그것도 대부분 장학사업 등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익사업에 투자한 것이지 보이지 않는 곳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기부는 그리 많지 않다.
기부문화는 내가 많이 가진 것을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선의 의미가 아니다. 내가 잘 될 수 있었던 것도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영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에서 그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은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없으면, 또 자신이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나는 운이 좋게도 성공한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면서 “사회에서 성공을 하고 부를 쌓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사회에 부를 환원하고 불평등을 개선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빌 게이츠의 말을 우리 기업인들은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인생은 남을 위해 산다’는 어머니의 가르침에 감사드리며 우리사회도 기부문화가 활성화됨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더불어 잘 사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