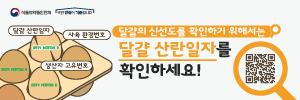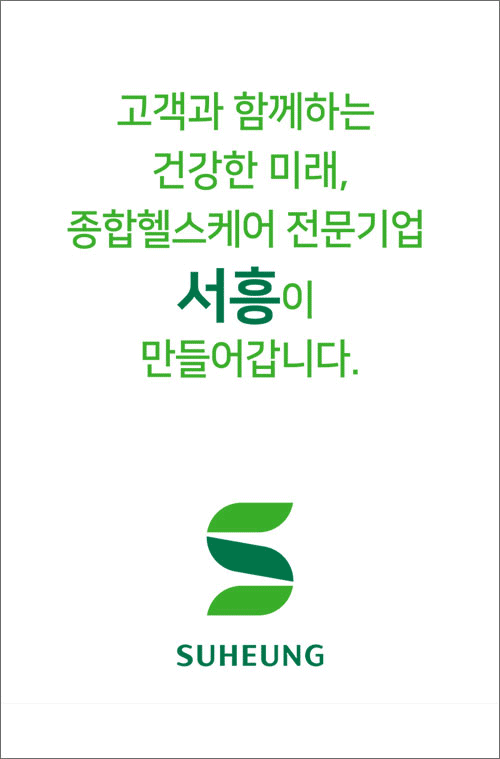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4차 산업혁명'의 바람이 식품업계에도 거세게 불고 있다. 식품.외식업 현장에서 로봇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할 날이 머지 않았다. 적은 노동으로 비용은 절감되고 생산성은 높아 질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기회일까? 위기일까?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선택을 넘어 필수라고 강조한다.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에 익숙한 소비자를 상대하지 못하면 살아 남지 못한 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수원 광교테크노밸리에 자리한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푸드투데이와 만난 이기원 서울대 생명공학과 교수는 "식품산업이 4차산업의 가장 꽃이라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식품산업은 소비자와의 접점이 가장 가까운 산업이기 때문이다.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가 워낙 막강한 부분이고 4차산업이 가장 많이 적용될 수 있는게 즐거움을 주는 영역이라면 이런 요소에서 식품이 차지하는게 훨씬 더 크다. 식품은 단지 즐거움을 주는 서비스 뿐만 아니라 제조를 끼고 있고 생산이라는게 결국 기후에 따라서 오늘 비가 올거냐, 안올거냐, 태풍이 오면 어느 쪽으로 갈거냐, 일기예보가 가장 농업의 핵심인데 그게 내년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짜면 생산관리를 정확하게 하는거죠. 농업이던 식품이던 그 어떤 산업보다도 훨씬 파급력이 있고 생산.가공.유통에서 4차산업이 쓰이지 않는 것은 단 한가지도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기존의 산업에 물리, 생명과학, 인공지능을 융합해 새로운 변화를 이끄는 차세대혁명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 3D 프린터, 나노, 바이오 기술 등을 활용해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현재 식품산업에서의 4차 산업에 대해서 "유통쪽에서는 이미 빅데이터를 이용하고 있고 제조에서도 4차 산업이 많이 활용되기 시작하고 있다"며 "실제 생산라인에 대한 데이터들을 이미지화 하고 실제로 데이터화시켜 직원이 한두 명 밖에 없어도 공장이 돌아가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찾고 그게 안됐을때 연락을 취하는 그런 생산관리 시스템. 이미 4차산업이 적용된 것들이 많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조업의 4차산업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임을 예고했다. 이 교수는 "기업들마다 제조공장에서도 100% 4차산업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시스템을 데이터화 하고 데이터로부터 분석해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는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제조쪽에서 그런 것들이 생산라인에서 깔리는 것은 굉장히 빠른시간에 다 깔릴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외식산업의 변화는 더 크다고 했다. "가상현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은 당연히 외식업에서 엄청나게 쓰일 것이다. 사람을 고용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다. 안전관리, 교육, 주방 쉐프가 바꼈을때 말이다"
그는 "외식업에서 주문 전화를 받는 것은 사람이 받는게 나을 수도 있지만 얼마나 목소리를 인간화 시킬거냐, 로봇 서비스 식당에서 로봇이 목소리와 행동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하느냐다"라며 "이미 우리가 느낄 정도의 서비스 로봇이 아직 없기 때문이지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4차 산업은 '기술'이 아닌 '감성'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가상현실이나 인공지능이 중요한게 아니라 사용자들이 느끼는 차별성이 뭐냐가 중요하기 떄문에 감성적인 영역을 무시할 수 없다"며 "감성적인 영역의 차별화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갈수록 플랫폼 기술은 있지만 맞춤형 서비스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식품 영역에 있어서도 건강 영역에 있을수도 있고 편리함 영역이 있을 수 있고 즐거움 영역에 있을 수 있는데 소비자들에게 타겟화된 제품 즉 소량 다품목으로 갈 것"이라고 전했다.
하나의 제품이 모든 소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량으로 다품목하고 맞춤형으로 가는 모델이 아마 4차산업하고 식품산업에 더 가까운 모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온라인 데이터를 활용해 자기의 상품을 맞춤형으로 빠르게 생산단계에서 유통까지 이뤄 질 수 있다고 한다면 큰 비지니스 모델이 아니라 개인 혼자서도 얼마든지 기획부터 유통까지 할 수 있는 4차산업 시대에 맞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문제는 없을까. 그는 법률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4차산업이라는 것은 사회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라며 "1인가구 시대가 는다, 고령화가 된다, 결혼의 방식이 바뀐다 그것을 과연 법이 따라갈 수 있느냐"라며 "이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뒤에 제도를 만들어서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기준이 설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4차산업이라는게 없는 것을 하겠다는게 아니라 기존에 다 있는거고 다만 그것들을 소비자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계가 대신해줄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감성적 영역의 요소가 있는데 얼마나 감성적 영역의 요소들을 4차산업이 대체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남은 과제"라며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는 것은 거의 다 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로만 듣고 영화 속에나 봤던 예를 들어 아바타 같은 이런 것들이 상상에만 존재하는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다 가능하고 실제로 해낼 수 있는 요소들이 다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인간을 이롭게 하는거냐 그래서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마지막으로 "4차산업이 우리의 삶에 스며드는 것은 고민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라며 "과연 인간은 왜 존재 해야하는지, 로봇이 다 하는데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나, 결론적으로 이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남들이 못하는 나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브랜드화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