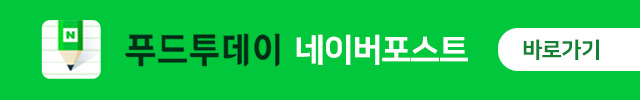각국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관리체계에 대해 정부부처와 각국 전문가, 학회, 업계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올바른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과 ILSA KOREA는 19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 국제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EU, 캐나다, 일본, 한국의 전문가들은 “건강기능식품의 부작용은 대부분 즉각적이지 않고 서서히 나타나는데다 충분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의 정보제공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U의 부작용 보고체계를 발표한 European Commission의 Jan Baegle 교수는 “EU의 주요 국가들이 함께하고 있는 Rapid Alert System for Food and Feed(RASFF)가 사용되고 있다”며 “RASFF는 위해성 확인 식품으로 마켓에서 유통 중인 식품은 ‘경고’, 시판 전 식품의 ‘정보’, 일반적인 발견사항이나 사회적 대두 상황의 ‘소식’으로 상황이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 정보는 회원국에 제공되며 각 회원국은 제공된 정보에 대한 조치사항을 다시 시스템에 보고하고 만일 회원국이 아닐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부작용 보고 및 시그널 분석’을 주제 발표한 Ochanomizu 대학의 Fumitake Fukutomi 교수는 “일본은 보건식품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고 보건식품을 식품으로 분류하고 있는 등 한국이나 다른 여러 국가들과 다른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다”며 “일본에는 정부승인 후 특별한 표시를 부착할 수 있는 ‘FOSHU’라는 보건기능식품에 대한 승인제도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부작용 관리체계는 소비자가 부작용으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이 사실을 중앙·지방정부에 보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건강식품판매 업소에 불만을 표시했을 때에도 보고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며 모니터링과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국민 대상교육과 소비자들의 정보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부작용 보고 및 시그널 분석’을 발표한 Health Canada의 Dr. Derek Wade는 “캐나다는 한국과 비슷한 체계로, 2002년도에 만들어진 Marketed Health Produxts Directorate(MHPD)가 운영되고 있다”며 “MHPD는 데이터 수집을 비롯해 시그널 탐지와 평가, 리스크 매니지먼트와 커뮤니케이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 시그널 분석’을 발표한 식약청 박경식 박사는 “우리나라는 사전인정제도와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후 안전관리를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자발적 부작용 신고가 가장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접근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비자의 신고를 검증해 오류정보를 걸러내는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박 박사는 “우리의 사후 안전관리 체계는 먼저 부작용 추정사례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유형을 분류해 통합적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시그널을 탐색해 시그널의 원인분석과 평가하는 단계로 이뤄져있다”며 시그널 탐색과 원인분석 단계도 경미한 사항은 통계적 접근하고 심각한 사례의 경우 신속한 접근을 통해 추적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단독] 오리온 ‘참붕어빵’ 곰팡이, 강제회수 전환…“포장기 노즐 교체 지연”
- 2 더벤티, LoL과 국내 첫 콜라보…‘영혼의 꽃’ 콘셉트 음료·굿즈 출시
- 3 GMO완전표시제, 알 권리인가 낙인인가…“GMO 유해성 근거 없다”
- 4 “다이소에 팔지 마라?”…공정위, 약사회 ‘건기식 유통 압박’ 제재 착수
- 5 [현장르포] "150년 전 강화도조약 떠올라"...美대사관 앞 선 한우농가의 절규
- 6 베트남산 '용과'서 기준치 11배 잔류농약 검출…전량 회수 조치
- 7 납 기준 초과 ‘햇살가득 토마토 즙’…식약처 “즉시 섭취 중단·반품하세요”
- 8 컴포즈커피, 산리오 콜라보 여름 한정 메뉴·굿즈 출시…“피크닉 감성 저격”
- 9 박진선 샘표 대표, 한국식품산업협회장 선임...5개월 공백 마침표
- 10 “쌀·소고기 지켰다”…한우협회, 1만 명 집회 전면 취소 “정부에 감사”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