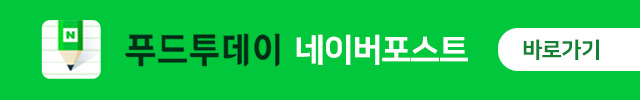한국인으로써 처음으로 신부가 된 분은 김대건 신부이고 처음으로 추기경이 된 분은 김 수환 신부이다.
조선조 말에 청년 김대건은 신부가 되려고 마카오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로 가서 공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1846년에 잡혀서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참수당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당시 17살밖에 안된 한 청년이 어렵사리 빼내서 150리 길을 달려 자신의 선산인 미리내에 안장하였다. 사람들에게 알리기는커녕 알려질까봐 겁이 났을 것이다. 163년 전의 일이다.
그 후 1857년에 교황청에서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되었고 1925년에 복자 위에 오른 뒤 1984년에 시성되어 성인 자리에 올랐다. 그의 믿음과 덕행의 보상이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당시 서슬이 퍼런 공포 분위기에서 백성들의 눈에는 그의 죽음이국사범으로 비참하게 비쳐졌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신의 수습마저도 어렵사리 몰래 할 수 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추기경의 죽음은 김대건 신부의 죽음과 비교할 때 극과 극이 된다. 그는 카톨릭 병원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고 수 백 만명 카톨릭신도들이 유리관에 그의 시신을 모시고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뿐 아니라 많은 신문과 방송이 톱 뉴스로 연일 수십만 조문객의 동향을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층 거의 모두가 조문을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국장이 아니지만 분위기는 국장이나 마찬가지의 애도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카톨릭 신부의 죽음이 국민들로부터 천지가 바뀐 것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천주교가 신자들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주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탄압하는 정부에 과감하게 맞섰던 때부터 일 것이다. 언론들조차 정권이 두려워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지금 보아서야 쉬운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다른 종교가 감히 해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정보부에 끌려가서 맞고 나왔다는 소리가 없어지고 선거에서 관권에 의한 부정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을 카톨릭과 카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돌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 정부가 들어선 것이 벌써 15년도 넘는데다 김추기경이 75세에 은퇴한 것이 12년 전이다. 따라서 그가 활발히 활동하던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애도를 표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가 되고 나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될 줄 알았다. 따라서 민주화만 이루면 많은 문제점이 저절로 없어지고 경제도 잘 돌아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 된 세상에서 혹독한 IMF 위기를 겪었고 이제 그 위기에서 막 벗어나는가 하였더니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를 연타로 맞은 것이다.
국민들은 우왕좌왕 살기 위해 헤매게 되고 누구도 믿을 만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을 잃게 되니 더욱 그 상실감이 크지 않았나 싶다. 마치 집안이 어렵게 되어 가족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중심이 되어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같은 격이리라.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으로 펴는 매력 또한 애도의 정을 더욱 높이는 것 같다. 추기경의 어머니는 평생 옹기와 포목을 팔고 다니며 아들 둘을 성직자로 만들었다. 김 추기경이 참으로 험난했던 시절 독재 정권에 맞서 곧은 소리를 당당히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강인했을 뿐 아니라 사랑을 몸소 보여주어 그가 일생 “사랑”을 입에 올리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처럼 그도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내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자리할 공간은 없어지는 법이다. 김 추기경은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면서도 사랑을 끝끝내 간직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결국 그의 속 깊은 사랑이 전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만든 바탕일 것이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조선조 말에 청년 김대건은 신부가 되려고 마카오에 있는 파리외방전교회로 가서 공부하고 조국으로 돌아왔지만 1846년에 잡혀서 새남터 순교성지에서 참수당하였다.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당시 17살밖에 안된 한 청년이 어렵사리 빼내서 150리 길을 달려 자신의 선산인 미리내에 안장하였다. 사람들에게 알리기는커녕 알려질까봐 겁이 났을 것이다. 163년 전의 일이다.
그 후 1857년에 교황청에서 가경자(可敬者)로 선포되었고 1925년에 복자 위에 오른 뒤 1984년에 시성되어 성인 자리에 올랐다. 그의 믿음과 덕행의 보상이 주어진 셈이다.
그러나 당시 서슬이 퍼런 공포 분위기에서 백성들의 눈에는 그의 죽음이국사범으로 비참하게 비쳐졌을 것이다. 오죽했으면 시신의 수습마저도 어렵사리 몰래 할 수 밖에 없었을까.
하지만 지난 2월 16일 선종한 김수환추기경의 죽음은 김대건 신부의 죽음과 비교할 때 극과 극이 된다. 그는 카톨릭 병원에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었고 수 백 만명 카톨릭신도들이 유리관에 그의 시신을 모시고 영혼을 위로하는 기도를 드렸다. 그 뿐 아니라 많은 신문과 방송이 톱 뉴스로 연일 수십만 조문객의 동향을 보도하였고 이에 따라 현 전직 대통령을 비롯해 권력층 거의 모두가 조문을 하였다.
공식적으로는 국장이 아니지만 분위기는 국장이나 마찬가지의 애도 분위기였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같은 카톨릭 신부의 죽음이 국민들로부터 천지가 바뀐 것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되었을까.
천주교가 신자들뿐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믿음을 얻게 된 것은 주로 민주화 운동의 과정에서 탄압하는 정부에 과감하게 맞섰던 때부터 일 것이다. 언론들조차 정권이 두려워서 진실을 제대로 보도하지 못하던 암울한 시절에 민주화 운동을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들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지금 보아서야 쉬운 것 같지만 당시로서는 다른 종교가 감히 해 내지 못하던 것이었다.
정권이 바뀌고 민주화가 이루어져 더 이상 정보부에 끌려가서 맞고 나왔다는 소리가 없어지고 선거에서 관권에 의한 부정이 없어지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민주화가 된 것을 실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공로의 상당 부분을 카톨릭과 카톨릭을 대표하는 김수환 추기경에게 돌리는 것 같다.
하지만 이 것 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민주화가 이루어져서 민주 정부가 들어선 것이 벌써 15년도 넘는데다 김추기경이 75세에 은퇴한 것이 12년 전이다. 따라서 그가 활발히 활동하던 때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에 이렇게 많은 국민이 애도를 표하는 것에는 다른 이유도 있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민주화가 되고 나면 모두가 골고루 잘 살게 될 줄 알았다. 따라서 민주화만 이루면 많은 문제점이 저절로 없어지고 경제도 잘 돌아갈 줄 알았던 것이다. 그런데 민주화 된 세상에서 혹독한 IMF 위기를 겪었고 이제 그 위기에서 막 벗어나는가 하였더니 다시 이전보다 더 심한 경제적 위기를 연타로 맞은 것이다.
국민들은 우왕좌왕 살기 위해 헤매게 되고 누구도 믿을 만한 방향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 같은 분을 잃게 되니 더욱 그 상실감이 크지 않았나 싶다. 마치 집안이 어렵게 되어 가족들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때 중심이 되어주던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것과 같은 격이리라.
김수환 추기경의 사랑으로 펴는 매력 또한 애도의 정을 더욱 높이는 것 같다. 추기경의 어머니는 평생 옹기와 포목을 팔고 다니며 아들 둘을 성직자로 만들었다. 김 추기경이 참으로 험난했던 시절 독재 정권에 맞서 곧은 소리를 당당히 해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강인함을 이어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강인했을 뿐 아니라 사랑을 몸소 보여주어 그가 일생 “사랑”을 입에 올리게 하였다. 그의 어머니처럼 그도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어 내는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일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사람의 가슴에 사랑이 자리할 공간은 없어지는 법이다. 김 추기경은 그 옳고 그름을 가려내면서도 사랑을 끝끝내 간직한 보기 드문 인물이었다. 결국 그의 속 깊은 사랑이 전 국민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게 만든 바탕일 것이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BBQ, 창립 30주년 맞아 ‘집단치성 콘테스트’…신메뉴 이름 공모
- 2 '비비고'로 K-푸드 선점했지만...CJ제일제당, 내수 소비 부진에 2분기 영업익 11.3%↓
- 3 식약처, 13일 ‘글로벌 해썹’ 정책 설명회…식품방어·사기 예방 요건 안내
- 4 [대체면 리뷰②] 1분 완성 대상 청정원 ‘콩담백면 비빔국수’…맛·식감·주의점 한눈에
- 5 CJ제일제당, 3000억 저당소스 시장 판 키운다...동원.대상에 도전장
- 6 더벤티×LoL 두 번째 콜라보…‘티모·포로’ 음료·크링빵·굿즈 출시
- 7 제주 여행 선물 인기품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소비기한 허위표시
- 8 농협, 먹방 유튜버 히밥과 손잡고 ‘한국농협김치’ 출시
- 9 “저나트륨혈증, 건강인에 드물다” 정희원 교수 팩트체크
- 10 ‘골드키즈’ 키 성장 시장 급부상…FGO 건기식 대기업 경쟁 격화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