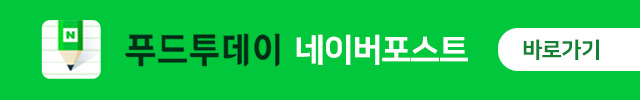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실물경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어 큰일났다고 한다. 불과 몇 달 만에 집 값이 반토막이 났고 원화의 화폐가치까지 떨어지면서 달러화로 표시된 집값은 60%~70%까지 떨어진 셈이 됐다.
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어떤 회사는 주주들에게 싯가대로 돈을 다 돌려주더라도 큰 돈이 남게 되는 회사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 집이나 주식을 살 때인가? 해외 교포들은 달러화를 보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비해 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지 않는 사람과 이제 가격이 실제 가치 이하로 떨어졌으니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의 위기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정책적 실패”에서 오는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낙관적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강력히 집행한다면 1년이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본다. 지난 IMF 때에 경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고질병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움츠린다.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이후 10여 년간 주식가격의 90%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오렌지가 창고에서 썩어 가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렌지를 못 먹어 비타민C 결핍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오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구매력을 창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국 정부의 관료들은 끊임없이 균형된 재정을 원했고 절약의 미덕을 강조해서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인한 미국의 높은 실업과 디플레이션은 결국 세계 대전중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높아진 생산성이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번 사태도 1929년의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때와 비슷한 대책을 내어 놓고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이자와 세금을 낮추어 구매력을 높여주면 경기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번의 위기는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다른 성격의 위기인 것은 아닐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간에 아무도 문제를 직시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근간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 특히 GM의 문제는 이번 위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어도 직접 원인은 아니다. GM의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욕은 주주에게도 정부에도, 경영진 그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산업을 들여다 보면 자동차, 가전, 전자, 일반 소비 상품 등 어느 것 하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력 저하가 금융투자의 결과생긴 이익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다.
주주는 배당 잘 해 주어 많이 얻고, 정부는 세금 잘 내니 문제 없고, 종업원은 복리후생 잘 해 주니 문제 없었다. 물론 경영자는 스톡옵션 받으며 문제 없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살려 준다 해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오히려 그 동안 잘 경영해온 온 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지게 될 뿐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의 위기는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위기가 시간을 끌더라도 살아 남을 준비와 각오를 하는 편이 좋겠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주식도 많이 떨어져서 어떤 회사는 주주들에게 싯가대로 돈을 다 돌려주더라도 큰 돈이 남게 되는 회사도 있다.
그러면 지금이 집이나 주식을 살 때인가? 해외 교포들은 달러화를 보내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이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지금이 살 때라고 생각해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전에 비해 값이 그렇게 많이 떨어졌는데도 사지 않는 사람과 이제 가격이 실제 가치 이하로 떨어졌으니 사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바로 이번의 위기를 보는 시각의 차이에서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이번의 위기가 “정책적 실패”에서 오는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은 낙관적이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강력히 집행한다면 1년이면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본다. 지난 IMF 때에 경험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하지만 이번 위기가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고질병에서 오는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본다. 앞으로 가격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사는 것은 돈을 잃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움츠린다. 1929년에 시작된 미국의 대공황 이후 10여 년간 주식가격의 90%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본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산더미처럼 쌓인 오렌지가 창고에서 썩어 가고 있는데도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오렌지를 못 먹어 비타민C 결핍증에 걸렸다는 것이다. 과거의 경제 이론에 의하면 오렌지 가격이 떨어졌으니 당연히 수요 공급 곡선에 의해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들에게 “구매력”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리 가격이 떨어져도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결국 구매력을 창조하기 위해 정부가 대규모로 돈을 풀어야 한다는 “케인즈”의 이론이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미국 정부의 관료들은 끊임없이 균형된 재정을 원했고 절약의 미덕을 강조해서 과거 경제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고 한다. 대공황으로 인한 미국의 높은 실업과 디플레이션은 결국 세계 대전중 전쟁물자 생산을 위해 높아진 생산성이 해결해 줄 때까지 계속 되었다.
이번 사태도 1929년의 대공황을 연구한 사람들이 그때와 비슷한 대책을 내어 놓고 있다. 정부에서 돈을 풀고 이자와 세금을 낮추어 구매력을 높여주면 경기는 살아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혹시 이번의 위기는 1929년 세계 대공황과 다른 성격의 위기인 것은 아닐까.
미국의 투자은행들의 방만한 경영이 이번 위기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간에 아무도 문제를 직시하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미국의 근간산업이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 특히 GM의 문제는 이번 위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기는 했어도 직접 원인은 아니다. GM의 방만한 경영 상태를 해결할 능력이나 의욕은 주주에게도 정부에도, 경영진 그 누구에게도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미국의 산업을 들여다 보면 자동차, 가전, 전자, 일반 소비 상품 등 어느 것 하나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지 않는 분야가 없었다. 문제는 그들의 경쟁력 저하가 금융투자의 결과생긴 이익에 가려서 안 보였던 것이다.
주주는 배당 잘 해 주어 많이 얻고, 정부는 세금 잘 내니 문제 없고, 종업원은 복리후생 잘 해 주니 문제 없었다. 물론 경영자는 스톡옵션 받으며 문제 없었다. 이런 기업들에게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살려 준다 해도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단 말인가. 오히려 그 동안 잘 경영해온 온 회사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의 옥석을 가리기 힘들어지게 될 뿐 문제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의 위기는 유동성 공급만으로 해결될 것 같지가 않다. 지금 위기가 시간을 끌더라도 살아 남을 준비와 각오를 하는 편이 좋겠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더벤티×LoL 두 번째 콜라보…‘티모·포로’ 음료·크링빵·굿즈 출시
- 2 '비비고'로 K-푸드 선점했지만...CJ제일제당, 내수 소비 부진에 2분기 영업익 11.3%↓
- 3 [대체면 리뷰②] 1분 완성 대상 청정원 ‘콩담백면 비빔국수’…맛·식감·주의점 한눈에
- 4 제주 여행 선물 인기품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소비기한 허위표시
- 5 CJ제일제당, 3000억 저당소스 시장 판 키운다...동원.대상에 도전장
- 6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국민·산업계와 현장 소통
- 7 “저나트륨혈증, 건강인에 드물다” 정희원 교수 팩트체크
- 8 상반기 3,700명 검거…정부 ‘마약 완전 차단’ 총력전 선포
- 9 농업정책·유통경제학 권위자 김호 교수,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 10 [푸드TV] 2조2천억 군 급식 시장 커지는데…세부 지침 ‘전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