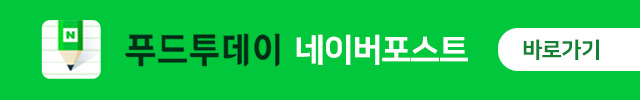오늘 새벽 남산 길은 흐리지만 포근하다. 초겨울임에도 며칠 전엔 영하 10도가 될 정도로 춥더니 오늘은 봄 날 같다. 가랑비에 젖은 나무 줄기와 잎들이 마치 봄이 되어 물이 오른 듯이 촉촉하다.
팔각정 쪽으로 880계단을 오르며 중간쯤 갔을 때 숲 속에서 한 여자분이 불쑥 나타났다. 순간 “그 쪽으로도 길이 나 있어요?”하고 엉겁결에 묻자 “개미에게 밥을 주고 오는 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새나 다람쥐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보았어도 개미에게, 그것도 새벽에 밥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궁금하였기에 대화가 이어졌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시는군요?”하고 물었다. 개미를 주제로 재미있는 글을 쓴 프랑스의 작가이다.
“맞아요. 지난 번에 그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나보았어요”한다.
개미들은 혼자 못 가져갈 만큼의 밥이 있으면 곧 동료들을 데려와서 협동작전으로 밥을 옮겨 간다고 했다. 발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협동할 줄 아는 작은 생물이 신기하다고 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작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청둥오리를 키우며 그게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요즈음 “자연 속으로”나 “늑대 토템”같은 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잘 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자연 속으로”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7년간이나 젊은 부부가 사자 등 동물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책이고 “늑대토템”은 11년 동안 늑대를 관찰하며 쓴 책이라고 한다.
그녀는 오리 알을 부화시킨 경험담을 얘기했다. 자신의 방에서 부화시켜 아기오리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엄마로 알고 항상 쫓아 다녔다고 했다. 남산에 산책 나올 때도 쫓아 나오곤 했는데 어느 날 바람에 쓸려 날아가는 단풍잎을 보며 가다가 그만 나무 등걸 사이에 만들어진 둥그런 틈에 몸이 끼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그 때에 오리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사람 살려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작가적 상상력인지 아니면 동물의 언어를 알아 듣는 신통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리가 자신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
오리가 그녀를 엄마로 알았다면 자기들도 엄마처럼 생겼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모두 엄마처럼 생겼으니 사람 속에 살면서 자신이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었겠다.
그런데 언제쯤 이 오리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 오리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리로 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리는 오리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도 빨리 그렇게 살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나중에 그 오리는 오리 사육장으로 보내줬다고 한다.
이 때 문득 우리 자신도 참 모습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착각 속에 있는 허상인 “나”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분에 넘치는 과시욕, 쓸데 없는 자존심, 체면 치레로 낭비하는 자원과 노력은 대가가 있다 해도 사실 낭비에 가깝다. 사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 유지가 힘들어지며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 때에는 불안감에서 더욱 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오리가 오리로 살아야 하듯 “나”는 “나”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녀는 남산에 “상상의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상상을 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다시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하여간 소설을 쓰는 분들은 재미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팔각정 쪽으로 880계단을 오르며 중간쯤 갔을 때 숲 속에서 한 여자분이 불쑥 나타났다. 순간 “그 쪽으로도 길이 나 있어요?”하고 엉겁결에 묻자 “개미에게 밥을 주고 오는 길이에요”라고 대답했다. 새나 다람쥐에게 밥을 주는 사람은 보았어도 개미에게, 그것도 새벽에 밥을 주는 사람은 처음이라 궁금하였기에 대화가 이어졌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를 좋아하시는군요?”하고 물었다. 개미를 주제로 재미있는 글을 쓴 프랑스의 작가이다.
“맞아요. 지난 번에 그가 한국에 왔을 때 만나보았어요”한다.
개미들은 혼자 못 가져갈 만큼의 밥이 있으면 곧 동료들을 데려와서 협동작전으로 밥을 옮겨 간다고 했다. 발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 협동할 줄 아는 작은 생물이 신기하다고 했다.
나중에 그녀는 자신이 작가라고 소개를 했는데 지난 몇 년간 청둥오리를 키우며 그게 대한 소설을 쓰고 있다고 했다. 요즈음 “자연 속으로”나 “늑대 토템”같은 책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니 잘 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자연 속으로”는 아프리카 초원에서 7년간이나 젊은 부부가 사자 등 동물을 관찰하면서 기록한 책이고 “늑대토템”은 11년 동안 늑대를 관찰하며 쓴 책이라고 한다.
그녀는 오리 알을 부화시킨 경험담을 얘기했다. 자신의 방에서 부화시켜 아기오리가 태어났는데 자기를 엄마로 알고 항상 쫓아 다녔다고 했다. 남산에 산책 나올 때도 쫓아 나오곤 했는데 어느 날 바람에 쓸려 날아가는 단풍잎을 보며 가다가 그만 나무 등걸 사이에 만들어진 둥그런 틈에 몸이 끼어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했다. 그 때에 오리가 소리를 크게 질렀는데 “사람 살려요!”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작가적 상상력인지 아니면 동물의 언어를 알아 듣는 신통력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리가 자신이 사람인 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되었다.
오리가 그녀를 엄마로 알았다면 자기들도 엄마처럼 생겼다고 믿고 있었을 것이다. 보이는 사람들마다 모두 엄마처럼 생겼으니 사람 속에 살면서 자신이 사람이라고 믿는 것이 이상할 것도 없었겠다.
그런데 언제쯤 이 오리는 자기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까. 이 오리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오리로 살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오리는 오리로 살아야 할 것이고 그것도 빨리 그렇게 살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나중에 그 오리는 오리 사육장으로 보내줬다고 한다.
이 때 문득 우리 자신도 참 모습의 “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나의 착각 속에 있는 허상인 “나”의 모습으로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의 참 모습을 부끄러워하고 이것저것 가리려고 하는 데서 많은 문제가 시작된 것 같다. 분에 넘치는 과시욕, 쓸데 없는 자존심, 체면 치레로 낭비하는 자원과 노력은 대가가 있다 해도 사실 낭비에 가깝다. 사회 생활을 잘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가정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일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직장 유지가 힘들어지며 소득과 재산이 줄어드는 때에는 불안감에서 더욱 무리를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럴 때는 그냥 오리가 오리로 살아야 하듯 “나”는 “나”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이다.
그녀는 남산에 “상상의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많은 사람이 상상을 하고 그것으로 이야기를 만들고 다시 다른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해서 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고… 하여간 소설을 쓰는 분들은 재미있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더벤티×LoL 두 번째 콜라보…‘티모·포로’ 음료·크링빵·굿즈 출시
- 2 '비비고'로 K-푸드 선점했지만...CJ제일제당, 내수 소비 부진에 2분기 영업익 11.3%↓
- 3 [대체면 리뷰②] 1분 완성 대상 청정원 ‘콩담백면 비빔국수’…맛·식감·주의점 한눈에
- 4 제주 여행 선물 인기품 ‘제주 소보루 타르트 세트’ 소비기한 허위표시
- 5 CJ제일제당, 3000억 저당소스 시장 판 키운다...동원.대상에 도전장
- 6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국민·산업계와 현장 소통
- 7 “저나트륨혈증, 건강인에 드물다” 정희원 교수 팩트체크
- 8 상반기 3,700명 검거…정부 ‘마약 완전 차단’ 총력전 선포
- 9 농업정책·유통경제학 권위자 김호 교수,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 10 [푸드TV] 2조2천억 군 급식 시장 커지는데…세부 지침 ‘전무’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