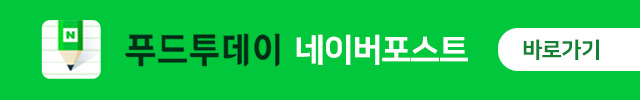옛날에 쥐가 한 마리 있었다. 그런데 그 쥐는 고양이가 무서워 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물주에게 빌었다. ‘고양이로 만들어 주시면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조물주는 그 쥐를 고양이로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고양이가 되면 무서운 것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웬걸, 이제는 호랑이가 무서웠다. 그래서 다시 조물주에게 가서 빌었다.
조물주는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다. 호랑이가 되면 이제야 정말 무서운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포수가 무서웠다. 포수에게 한 번 걸리면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도 살아 남지 못했다. 결국 조물주는 그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엇이 되든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가 없구나, 그냥 쥐로 사는 게 좋겠다.”
“장자”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장자가 어느 날 숲 속에서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자신을 스치듯 날아가 근처 밤나무에 가서 앉았다. 깜짝 놀란 “장자”는 `장님 같은 새`라며 까치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까치는 나무 그늘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다. 그 것도 모르고 그 사마귀는 그 밑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다. 까치나 사마귀나 모두 눈 앞의 사냥감에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몸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장자는 “먹이를 노리는 것은 또한 자기도 먹이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익을 좇는 것은 또한 손해를 불러오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로다” 하며 서둘러 밤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밤나무 숲을 지키는 관리인에게 잡혀 “밤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60년대 초만 해도 많은 농촌 사람들이 봄이 되면 먹을 쌀이 떨어져 보리를 거둘 때까지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춘궁기를 지내는 것이 큰 일이었다. 그때는 정말 춘궁기만 없어지만 살 것 같았다. 얼마 후 춘궁기가 해결되자 이제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다. 농촌의 소란 소는 거의 아이들 등록금 용으로 쓰여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소 뼈로 쌓은 탑, 우골탑”이라고 불렀다.이때엔 다시 아이들 학교만 마치게 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파트 붐이 불게 되자 이제는 작더라도 아파트 한 채 만 내 집으로 마련하면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는 다시 더 큰 아파트로, 거기에서 자동차로, 다시 기러기 아빠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결국 우리 사회가 계속 되는 한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쥐의 심장”은 우리를 계속 지치게 할 것이다. 언제나 돈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씩 모자란다. 왜냐하면 “쥐의 심장”이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것,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만 한다.
안전한 정기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펀드”가 이익이 많다고 너도나도 “펀드”에 들었는데 한 때 돈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자의 우려대로 이득을 좇는 것은 또한 손해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을 듯한 미국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결국 우리들의 펀드를 반 토막 내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IMF위기가 와서 은행과 대기업들이 막 넘어갔을 때 IMF는 고금리를 권해 할 때, 금리가 연 24%로 급등하고 많은 중소기업도 도산했는데, 이번에 보니 자기들은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다. 또 미국 내 은행을 도와줘야 한다며 수천억 달러를 마련한다는데 결국 “달러”를 더 많이 찍어 내야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개인은 고스란히 가치 하락을 당해야 한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득을 쫓는 동안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유수의 경제지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음모다”라고만 대응하고 있다.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보고 잡아 먹히지 않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쥐의 심장”을 버릴 수 있을 때 까지는 결국 이익이 있는 곳에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장자의 말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조물주는 그 고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 주었다. 호랑이가 되면 이제야 정말 무서운 것이 없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포수가 무서웠다. 포수에게 한 번 걸리면 아무리 무서운 호랑이도 살아 남지 못했다. 결국 조물주는 그 호랑이를 다시 쥐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너는 무엇이 되든 쥐의 심장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움에서 벗어 날 수가 없구나, 그냥 쥐로 사는 게 좋겠다.”
“장자”에는 이런 얘기도 있다. 장자가 어느 날 숲 속에서 사냥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까치 한 마리가 자신을 스치듯 날아가 근처 밤나무에 가서 앉았다. 깜짝 놀란 “장자”는 `장님 같은 새`라며 까치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그 까치는 나무 그늘에 있는 사마귀를 노리고 있었다. 그 것도 모르고 그 사마귀는 그 밑에 있는 매미를 노리고 있는 중이었다. 까치나 사마귀나 모두 눈 앞의 사냥감에 마음이 빼앗겨 자신의 몸에 닥친 위험을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장자는 “먹이를 노리는 것은 또한 자기도 먹이가 된다는 것이구나. 이익을 좇는 것은 또한 손해를 불러오는 것이니 위험한 일이로다” 하며 서둘러 밤나무 숲을 빠져 나왔다. 그러나 밤나무 숲을 지키는 관리인에게 잡혀 “밤 도둑”으로 오해를 받게 된다는 얘기이다.
60년대 초만 해도 많은 농촌 사람들이 봄이 되면 먹을 쌀이 떨어져 보리를 거둘 때까지 굶기를 밥 먹듯 하며 춘궁기를 지내는 것이 큰 일이었다. 그때는 정말 춘궁기만 없어지만 살 것 같았다. 얼마 후 춘궁기가 해결되자 이제는 자식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게 되었다. 농촌의 소란 소는 거의 아이들 등록금 용으로 쓰여 대학을 상아탑이 아니라 “소 뼈로 쌓은 탑, 우골탑”이라고 불렀다.이때엔 다시 아이들 학교만 마치게 되면 부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아파트 붐이 불게 되자 이제는 작더라도 아파트 한 채 만 내 집으로 마련하면 세상에 아쉬울 것이 없을 것 같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파트는 다시 더 큰 아파트로, 거기에서 자동차로, 다시 기러기 아빠로 끊임없이 이어져 간다.
결국 우리 사회가 계속 되는 한 더 나은 것을 끊임없이 원하는 “쥐의 심장”은 우리를 계속 지치게 할 것이다. 언제나 돈은 필요한 것보다 조금씩 모자란다. 왜냐하면 “쥐의 심장”이 언제나 지금보다 조금 더 큰 것, 나은 것을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돈을 좀 더 많이 벌어야만 한다.
안전한 정기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펀드”가 이익이 많다고 너도나도 “펀드”에 들었는데 한 때 돈을 더 많이 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장자의 우려대로 이득을 좇는 것은 또한 손해를 불러오는 것이었다. 우리하고 전혀 관계 없을 듯한 미국 사람들의 부동산 투기가 결국 우리들의 펀드를 반 토막 내게 만들었다.
우리나라에 IMF위기가 와서 은행과 대기업들이 막 넘어갔을 때 IMF는 고금리를 권해 할 때, 금리가 연 24%로 급등하고 많은 중소기업도 도산했는데, 이번에 보니 자기들은 경기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오히려 금리를 내리고 있다. 또 미국 내 은행을 도와줘야 한다며 수천억 달러를 마련한다는데 결국 “달러”를 더 많이 찍어 내야하고 세계 여러 곳에서 달러를 가지고 있는 나라와 개인은 고스란히 가치 하락을 당해야 한다.
세상은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이득을 쫓는 동안 우리보다 더 큰 것들은 우리를 잡아 먹으려고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세계 유수의 경제지들이 우리나라가 다시 외환위기를 맞을지도 모른다고 보도하는데 우리 정부는 “음모다”라고만 대응하고 있다.
좀 더 차분히 들여다보고 잡아 먹히지 않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면 좋겠다. “쥐의 심장”을 버릴 수 있을 때 까지는 결국 이익이 있는 곳에 더 큰 위험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장자의 말을 기억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더벤티×LoL 두 번째 콜라보…‘티모·포로’ 음료·크링빵·굿즈 출시
- 2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국민·산업계와 현장 소통
- 3 상반기 3,700명 검거…정부 ‘마약 완전 차단’ 총력전 선포
- 4 [푸드TV] 2조2천억 군 급식 시장 커지는데…세부 지침 ‘전무’
- 5 농업정책·유통경제학 권위자 김호 교수,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 6 [푸드TV] “영세업체 자가품질검사 부담”…식약처 ‘정책이음’서 현장 목소리 봇물
- 7 서흥, 상반기 순이익 224% 급증…건기식·캡슐 부문이 견인
- 8 [인터뷰] 최충렬 사무관 “글로벌 해썹, K-푸드 수출 경쟁력 높일 국제 표준”
- 9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1,319억…행정패소 93% 차지, 전년比 73%↑
- 10 “맥주가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무알콜부터 라거까지...주류업계, 뜨거운 여름밤 공략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