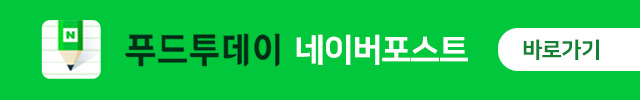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영국 외교관 ‘커즌”이 조선을 여행하고 나서 쓴 책에 당시 서울의 거리를 묘사한 부분이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진 지금의 우리로서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당시 서울은 초라하고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런 곳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는 서울이 당시 중국의 북경이나 광동에서처럼 아름다운 조각이나 금박의 장식 또는 여러 색깔의 광고 판 같은 것으로 치장된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을 기이하게 보았는데 그 이유를 일정규모 이상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 “편협한 사치금지법”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야 당시 물자가 부족할 때였으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 바람에 좋은 민간 건축물이 지어지지 못했고 우리 후손들이 볼 만한 것이 남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 가 보면 성공한 민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집을 크게 짓는데 그 집이 3~4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결국 공공의 소유로 되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쓰이는 이름다운 유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경우 남아있는 문화재라면 거의 왕궁이나 관공서 또는 사찰들이 대부분일 뿐 시대별로 그 때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래 남을 건축물이라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최고의 설계와 건축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게 될 터이고 따라서 짓는 사람에게 무언가 무형의 심적 보상이라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저자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다.
“서울 도심의 집들이 아름다움이란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진흙, 종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지금의 서울 모습을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모두가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돈 벌어주는 대상으로만 볼 때는 미적 감각이 없는 아파트의 모습이 눈에 띠일 리가 없지만, 사실 조금의 심미안이라도 있다면 아파트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은 건물은 후세에 누가 부수더라도 결국 부숴질 거라고 했다. 건축물이 오래 남게 하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미적 감각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지어야 오래 살아 남아 후대에 문화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막아서 안된다. 세금폭탄으로 억눌러서도 안된다.
이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나 우리 후손들이 물려 받을 문화재가 된다.
프랑스는 원래 날씨가 여름에도 견딜만해서 에어컨이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여름기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에어컨을 달아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길거리에 면한 건물의 외관을 집주인이라고 맘대로 바꿀 수 없는 점이다.
그 이유는 건물의 외관은 행인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즐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집주인이라도 제 마음대로 외관을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집 앞쪽으로는 에어컨을 달수가 없어서 집 뒤 쪽의 상당한 두께의 돌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포기 상태라고 들었다. 결국 가전 회사들이 실외기 없이도 냉방이 되는 에어컨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우리는 어떤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대로변에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를 마구 허가 해 주어 매일 아름답지 않은 그 것을 보면서 참고 다녀야 한다. 돈을 적게 들여 지으려 하다 보니 설계부터 자재 색상까지 싸구려로 지은 폼이 너무나 눈에 띠어 저런 건물은 30년도 못 가 다시 헐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변이나 한강변, 그리고 스카이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건물군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거리를 볼 권리를 위해서라도 설계, 건축자재, 색깔, 높이, 건축물의 각도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100년 전에 “커즌”이 말했던 “편협한 사치금지법”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 기회에 좀 정리하여 후세에게 “아름다운 문화재의 거리”를 남겨 주고 싶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그는 서울이 당시 중국의 북경이나 광동에서처럼 아름다운 조각이나 금박의 장식 또는 여러 색깔의 광고 판 같은 것으로 치장된 건축물이 전혀 없는 것을 기이하게 보았는데 그 이유를 일정규모 이상의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한 “편협한 사치금지법”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사치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야 당시 물자가 부족할 때였으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 바람에 좋은 민간 건축물이 지어지지 못했고 우리 후손들이 볼 만한 것이 남지 못하게 된 것이 아쉽다. 미국의 웬만한 도시에 가 보면 성공한 민간인들이 돈을 많이 벌어 집을 크게 짓는데 그 집이 3~4대에 걸쳐 내려오면서 결국 공공의 소유로 되어 미술관이나 박물관으로 쓰이는 이름다운 유적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경우 남아있는 문화재라면 거의 왕궁이나 관공서 또는 사찰들이 대부분일 뿐 시대별로 그 때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오래 남을 건축물이라면 당대 최고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최고의 자재를 사용해서 최고의 설계와 건축을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당연히 돈이 많이 들게 될 터이고 따라서 짓는 사람에게 무언가 무형의 심적 보상이라도 주어져야 할 것이다.
위의 저자는 자기 책에서 이렇게 썼다.
“서울 도심의 집들이 아름다움이란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으로 진흙, 종이, 목재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가 지금의 서울 모습을 기록한다면 다음과 같지 않을까.
“서울의 거의 모든 아파트들은 아름다움이 전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천편일률적인 모습에 모두가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으로 지어졌기 때문이다”
아파트를 돈 벌어주는 대상으로만 볼 때는 미적 감각이 없는 아파트의 모습이 눈에 띠일 리가 없지만, 사실 조금의 심미안이라도 있다면 아파트들이 아름답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아름답지 않은 건물은 후세에 누가 부수더라도 결국 부숴질 거라고 했다. 건축물이 오래 남게 하려면 우리 후손들이 우리보다 훨씬 미적 감각의 수준이 높아질 것을 감안해서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지어야 오래 살아 남아 후대에 문화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최고로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것을 막아서 안된다. 세금폭탄으로 억눌러서도 안된다.
이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것이 되고 많은 세월이 지나 우리 후손들이 물려 받을 문화재가 된다.
프랑스는 원래 날씨가 여름에도 견딜만해서 에어컨이 없이도 지낼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기상이변으로 여름기온이 높아지는 바람에 에어컨을 달아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문제는 길거리에 면한 건물의 외관을 집주인이라고 맘대로 바꿀 수 없는 점이다.
그 이유는 건물의 외관은 행인들에게 아름다운 길을 즐길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집주인이라도 제 마음대로 외관을 손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결국 집 앞쪽으로는 에어컨을 달수가 없어서 집 뒤 쪽의 상당한 두께의 돌을 뚫고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 것이 보통 일이 아니라서 포기 상태라고 들었다. 결국 가전 회사들이 실외기 없이도 냉방이 되는 에어컨을 개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할 판이다.
우리는 어떤가. 하루에도 수십만 명이 지나가는 대로변에 아름다움과는 거리가 먼 아파트를 마구 허가 해 주어 매일 아름답지 않은 그 것을 보면서 참고 다녀야 한다. 돈을 적게 들여 지으려 하다 보니 설계부터 자재 색상까지 싸구려로 지은 폼이 너무나 눈에 띠어 저런 건물은 30년도 못 가 다시 헐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변이나 한강변, 그리고 스카이라인을 표현할 수 있는 건물군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아름다운 거리를 볼 권리를 위해서라도 설계, 건축자재, 색깔, 높이, 건축물의 각도 등에 대해 전체적인 조화를 맞추는 도시계획이 필요하다.
100년 전에 “커즌”이 말했던 “편협한 사치금지법”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다면 이 기회에 좀 정리하여 후세에게 “아름다운 문화재의 거리”를 남겨 주고 싶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더벤티×LoL 두 번째 콜라보…‘티모·포로’ 음료·크링빵·굿즈 출시
- 2 식약처, ‘식의약 정책이음 열린마당’ 식품편…국민·산업계와 현장 소통
- 3 상반기 3,700명 검거…정부 ‘마약 완전 차단’ 총력전 선포
- 4 [푸드TV] 2조2천억 군 급식 시장 커지는데…세부 지침 ‘전무’
- 5 농업정책·유통경제학 권위자 김호 교수, 농어업특위 위원장에
- 6 [푸드TV] “영세업체 자가품질검사 부담”…식약처 ‘정책이음’서 현장 목소리 봇물
- 7 서흥, 상반기 순이익 224% 급증…건기식·캡슐 부문이 견인
- 8 [인터뷰] 최충렬 사무관 “글로벌 해썹, K-푸드 수출 경쟁력 높일 국제 표준”
- 9 공정위 과징금 환급액 1,319억…행정패소 93% 차지, 전년比 73%↑
- 10 “맥주가 빠지면 축제가 아니지” 무알콜부터 라거까지...주류업계, 뜨거운 여름밤 공략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