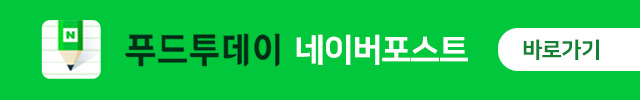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1989년의 대한민국은 이것을 ‘공업용 쓰레기’라고 불렀다. 하지만 2025년의 대한민국은 똑같은 이것을 ‘전설의 풍미’라고 부르며 한 달 만에 700만 개를 먹었다.
36년 전, 멀쩡한 기업을 도산 직전까지 몰고 갔던 ‘죽음의 성분’이 도대체 어떤 마법을 부렸기에 ‘프리미엄의 상징’으로 둔갑해 우리 식탁에 다시 올랐을까? 우리가 몰랐던, 혹은 오해했던 ‘기름’의 진실. 바로 삼양식품의 ‘우지(牛脂·소기름)’ 이야기다.
최근 식품 업계의 최대 화두는 단연 삼양식품의 신제품 ‘삼양 1963’이다. 출시 한 달 만에 700만 개 판매 돌파. 기존 라면보다 가격이 1.5배나 비싼 프리미엄 제품임에도 품절 대란이 일어났다. 이 숫자가 충격적인 이유는 이 제품의 핵심 세일즈 포인트가 다름 아닌 ‘우지’이기 때문이다.
시계를 36년 전으로 되돌려보자. 1989년 발생한 이른바 ‘우지 파동’은 한국 식품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흑역사다. 당시 검찰은 삼양식품이 라면을 튀기는 데 사용한 우지가 미국에서 공업용으로 분류된다며 회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했다. 사실 정제 및 가공 과정을 거쳐 식용 가능한 2등급 유지였지만 ‘공업용’이라는 단어가 주는 공포는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켰다.
결국 1997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지만 상처는 깊었다. 그 사이 농심은 라면 시장을 장악했고, 삼양식품에게 우지는 쳐다보기도 싫은 ‘금기어’가 되었다. 이후 라면 업계는 팜유(식물성 기름)가 표준이 됐고, 삼양라면 특유의 구수하고 묵직한 맛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36년 만에 왜?
그렇다면 삼양은 왜 하필 지금, 2025년의 끝자락에 그 아픈 손가락을 다시 꺼내 들었을까. 여기에는 철저한 계산과 자신감이 깔려 있다.
우선, '불닭’이 벌어다 준 맷집이다. 과거의 삼양은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였으나, 지금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불닭볶음면’을 가진 글로벌 기업이 됐다. 탄탄한 자금력과 브랜드 파워는 과거의 논란을 정면 돌파할 수 있는 맵고 강력한 갑옷이 됐다.
‘맛의 기준’이 변했다. ‘지방은 무조건 나쁘다’던 시대는 지났다. 저탄고지 트렌드 등을 거치며 좋은 동물성 지방은 풍미의 원천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다. 깔끔하지만 가벼운 팜유 국물에 지친 소비자들은 이제 1960년대 원조 라면이 가졌던 ‘진한 고기 국물’을 갈구하고 있다. 삼양은 이 빈틈을 우지라는 ‘오리지널리티’로 파고들었다.
경쟁사를 향한 ‘선전포고’. 농심이 장악한 국물 라면 시장에서 점유율을 뺏어오기 위해, 삼양은 “우리가 1963년 처음 들여온 그 맛이 진짜 라면”이라는 정통성 프레임을 걸었다. 36년 전 억울하게 뺏긴 왕관을 되찾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결과는 대성공이다. 700만 개의 판매량은 소비자들이 36년 전의 ‘공포’ 대신 현재의 ‘맛’을 선택했다는 증거다. MZ세대는 우지를 ‘새로운 힙한 맛’으로, 중장년층은 ‘그리운 옛맛’으로 받아들였다.
삼양의 우지 라면은 단순한 복고 상품이 아니다. 기업이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유산으로 승화시켜, 36년 만에 스스로 명예 회복에 성공한 반전 드라마다. ‘공업용’이라는 누명을 쓰고 폐기되었던 우지가 ‘프리미엄’이라는 옷을 입고 돌아온 지금, 맵고 뜨끈한 국물 한 그릇에서 느껴지는 깊은 풍미가 유독 각별하게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