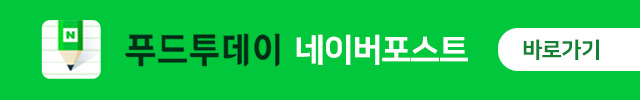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떡국을 먹여야지 한 살을 더 먹는게지”하는 할아버지 말씀에 손녀는 “ 그럼, 전 10그릇 먹을래요”하고 대답한다. 새해가 되면 늘 볼 수 있는 가족 간의 대화이다. 새해에는 꼭 떡국을 챙겨 먹는 것이 우리네 풍습인 만큼, 떡은 명절이 되면 꼭 빠지지 않는 식탁에 오르는 우리의 전통적인 음식이다.
떡이란, 대개 곡식가루를 반죽해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으로,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를 함께 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며 별식으로 꼽혀 왔다. 그래서인지 ‘밥 위에 떡’이란 속담도 생겨났다.
마음에 흡족하게 가졌는데도 더 주어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 말은, 밥보다 떡을 더욱 맛있게 생각하는 별식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떡은 한자로는 병(餠)이라고 표기한다. 떡을 조리 형태로 정의하면 ‘곡물의 분식 형태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례’에는 구이분자라 하였다.
구는 볶은 콩이고, 이는 합쳐서 찐다는 뜻이고, 분은 콩가루를 뜻하며 자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찹쌀이나 기장쌀을 가루로 만들어 볶은 콩을 얹어 만든 떡이 구이이고, 찹쌀이나 기장쌀을 쪄서 메에 친 다음 모양을 만들어 콩가루로 묻힌 것이 분자이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밀가루가 보급되기 전이므로 이(餌)라 표기하고, 밀가루가 보급된 후에는 병이라 표기했다.
이(餌)는 쌀, 기장 조, 콩 등 밀가루가 아닌 곡물을 원료로 만든 것이고, 밀가루를 반주해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한 것을 통들어 병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떡의 문헌은 구체적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시루가 발견되고 고구려벽화에서 음식을 시루에 찌고 있는 주방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에는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해 세시마다 술, 감주, 떡, 밥, 차, 과실 등 여러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고 돼 있어 떡이 제수 음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엔 원나라 문서인 ‘거가필용’에는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긴 뒤 찧어 가루를 내고 3분의 2정도 섞은 다음 꿀물을 넣고 축인 것을 쪄 익혀먹는 고려율고가 소개되고 있고 에는 유두일에 먹는 단자병과 점서(粘黍)에 관한 시가 수록 되었으며, 이수광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 “고려에서 상사일에 쑥떡을 으뜸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어 떡이 절식으로 지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음식은 예로부터 약식동원의 조리법이 발달돼 떡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떡들이 개발, 전수돼 왔다.
이런 떡을 약떡이라고 하는데 먼저 ‘구선왕도고’라는 떡은, 멥쌀가루에 연육 산약 백복령 의이인 맥아 백변두 능인 시상등 의 한약재를 섞어, 가루가 촉촉하도록 끓인 설탕물과 꿀을 내려 찐 떡이다. 구선왕도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복령조화고라는 약떡도 있다.
복령조화고에는 구선왕도고에 들어가는 한약재 가운데 백복령 연육 산약이 들어가고, 그 밖에 검인이 들어간다. 검인은 가시연밥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백합의 비늘줄기를 짓찧어 물에 가라앉혀 웃물을 따라 버리고 앙금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밀가루를 섞어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 떡의 재료인 백합의 비늘줄기는 산에서 나는 나리의 비늘줄기를 가을이나 봄에 캐서 말려 두었다가 쓴다.
이 밖에 향토떡으로 전해지는 약떡도 있다. 제주도의 쑥떡과 전라도의 구기자화전·구기자약떡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주도의 쑥떡은 그곳 방언으로 ‘속떡’이라고도 부르며, 멥쌀가루, 메밀가루, 보릿가루, 고구마가루에 각각 쑥을 넣어 만든다.
이 떡은 특히 쑥이 많이 나는 3, 4월에 많이 만든다. 전라도의 구기자화전은 구기자 잎으로 모양을 내 만든 화전인데 구기자 잎에 있는 많은 루틴을 섭취할 수 있다.
또 구기자 약떡은 찹쌀과 멥쌀을 가루로 빻을 때 구기자를 함께 넣고 빻아 찐 떡이다. 이 떡의 재료인 구기자는 구기자나 무르익은 열매로,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려 두었다가 이용한다.
이렇듯 몸에 이로운 약재를 이용해 일찍부터 떡을 만들어 평상시에 먹어왔다는 것은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이며, 이는 우리 떡 문화의 한 특징을 말해 주는 것이다.
떡은 나누어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하게 됐을 것이다.
떡은 단순히 찌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찌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지지는 떡으로 나뉜다. 떡은 찌는 과정이 쉽다고 하지만 쌀의 성질을 잘 알아야 모양이 좋고 질감이 좋은 떡을 만들 수가 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떡이란, 대개 곡식가루를 반죽해 찌거나 삶아 익힌 음식으로, 농경문화의 정착과 그 역사를 함께 하는 우리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이며 별식으로 꼽혀 왔다. 그래서인지 ‘밥 위에 떡’이란 속담도 생겨났다.
마음에 흡족하게 가졌는데도 더 주어서 그 이상 바랄 것이 없을 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이 말은, 밥보다 떡을 더욱 맛있게 생각하는 별식임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떡은 한자로는 병(餠)이라고 표기한다. 떡을 조리 형태로 정의하면 ‘곡물의 분식 형태의 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주례’에는 구이분자라 하였다.
구는 볶은 콩이고, 이는 합쳐서 찐다는 뜻이고, 분은 콩가루를 뜻하며 자는 모양을 만든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찹쌀이나 기장쌀을 가루로 만들어 볶은 콩을 얹어 만든 떡이 구이이고, 찹쌀이나 기장쌀을 쪄서 메에 친 다음 모양을 만들어 콩가루로 묻힌 것이 분자이다.
한대(漢代) 이전에는 밀가루가 보급되기 전이므로 이(餌)라 표기하고, 밀가루가 보급된 후에는 병이라 표기했다.
이(餌)는 쌀, 기장 조, 콩 등 밀가루가 아닌 곡물을 원료로 만든 것이고, 밀가루를 반주해 굽거나, 찌거나, 삶거나, 기름에 튀기거나 한 것을 통들어 병이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떡의 문헌은 구체적으로 삼국시대의 고분에서 시루가 발견되고 고구려벽화에서 음식을 시루에 찌고 있는 주방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다.
삼국유사 에는 “조정의 뜻을 받들어 그 밭을 주관해 세시마다 술, 감주, 떡, 밥, 차, 과실 등 여러가지를 갖추고 제사를 지냈다”고 돼 있어 떡이 제수 음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고려시대엔 원나라 문서인 ‘거가필용’에는 밤을 그늘에 말려서 껍질을 벗긴 뒤 찧어 가루를 내고 3분의 2정도 섞은 다음 꿀물을 넣고 축인 것을 쪄 익혀먹는 고려율고가 소개되고 있고 에는 유두일에 먹는 단자병과 점서(粘黍)에 관한 시가 수록 되었으며, 이수광은 그의 저서 ‘지봉유설’에 “고려에서 상사일에 쑥떡을 으뜸으로 했다”는 내용이 있어 떡이 절식으로 지리 잡았음을 알 수 있다.
우리 음식은 예로부터 약식동원의 조리법이 발달돼 떡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강유지에 도움이 되는 떡들이 개발, 전수돼 왔다.
이런 떡을 약떡이라고 하는데 먼저 ‘구선왕도고’라는 떡은, 멥쌀가루에 연육 산약 백복령 의이인 맥아 백변두 능인 시상등 의 한약재를 섞어, 가루가 촉촉하도록 끓인 설탕물과 꿀을 내려 찐 떡이다. 구선왕도고와 비슷한 방법으로 만든 복령조화고라는 약떡도 있다.
복령조화고에는 구선왕도고에 들어가는 한약재 가운데 백복령 연육 산약이 들어가고, 그 밖에 검인이 들어간다. 검인은 가시연밥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백합의 비늘줄기를 짓찧어 물에 가라앉혀 웃물을 따라 버리고 앙금을 말려 가루로 만든 뒤 밀가루를 섞어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 떡의 재료인 백합의 비늘줄기는 산에서 나는 나리의 비늘줄기를 가을이나 봄에 캐서 말려 두었다가 쓴다.
이 밖에 향토떡으로 전해지는 약떡도 있다. 제주도의 쑥떡과 전라도의 구기자화전·구기자약떡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제주도의 쑥떡은 그곳 방언으로 ‘속떡’이라고도 부르며, 멥쌀가루, 메밀가루, 보릿가루, 고구마가루에 각각 쑥을 넣어 만든다.
이 떡은 특히 쑥이 많이 나는 3, 4월에 많이 만든다. 전라도의 구기자화전은 구기자 잎으로 모양을 내 만든 화전인데 구기자 잎에 있는 많은 루틴을 섭취할 수 있다.
또 구기자 약떡은 찹쌀과 멥쌀을 가루로 빻을 때 구기자를 함께 넣고 빻아 찐 떡이다. 이 떡의 재료인 구기자는 구기자나 무르익은 열매로, 가을에 열매를 따서 말려 두었다가 이용한다.
이렇듯 몸에 이로운 약재를 이용해 일찍부터 떡을 만들어 평상시에 먹어왔다는 것은 선조들의 대단한 지혜이며, 이는 우리 떡 문화의 한 특징을 말해 주는 것이다.
떡은 나누어 먹을 수 있고, 한 번에 많은 양을 조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발전하게 됐을 것이다.
떡은 단순히 찌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방법에 따라 크게 찌는 떡, 치는 떡, 빚는 떡, 지지는 떡으로 나뉜다. 떡은 찌는 과정이 쉽다고 하지만 쌀의 성질을 잘 알아야 모양이 좋고 질감이 좋은 떡을 만들 수가 있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롯데칠성 ‘웃고’ 롯데웰푸드 ‘울고’...신동빈 채찍질에 엇갈린 상반기 실적
- 2 계열사 39곳 누락…농심 신동원 회장, 대기업 지정 회피 의혹
- 3 식품첨가물 기준 위반…비오효모·밀크씨슬 등 동화약품·보령 제품 회수
- 4 한 셋트에 3만원? 프리미엄 버거의 몰락...원조 가성비 버거가 채운다
- 5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12시간 맞교대' 흔들…식품업계, 근무제 개편 확산
- 6 노인복지주택도 급식 제공 의무화 추진…“삶의 질 높인다”
- 7 “사과도 수입되나”…한미 관세협상에 과수농가 ‘생존권 경고등’
- 8 닭 189만 마리 폐사…정부-계열사 ‘폭염·호우 총력 대응’
- 9 고창군, 추석 전 군민활력지원금 1인당 20만 원 지급 결정
- 10 윤준병 의원, ‘무항생제·무농약’ 제품 녹색제품 지정 추진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