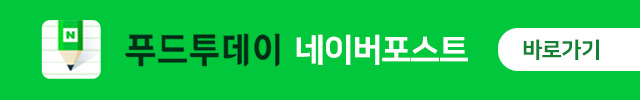제주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에 맞서 고려시대부터 진상품으로 명성이 높았던 '제주흑우(黑牛)'를 명품브랜드로 육성한다.
도는 현재 730마리인 제주흑우를 2017년까지 3만마리로 증식하기로 하고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등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대량증식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흑우의 명품화는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시피 저렴한 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왜소한 체격을 키우고 성장기간을 단축시키는 품종개량 등 과제도 적지 않다.
◇왜 흑우를 주목하나 = 제주도는 흑우가 유일하게 도내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희소성에다 육질이 뛰어나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명품 쇠고기인 와규(和牛)처럼 최고급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기원전부터 제주에서 사육된 것으로 전해지는 제주흑우는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고려시대부터 임금님의 생일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 등 '삼명일'에 진상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숙종 28년(1702년)에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섬을 한바퀴 돌며 화공에게 그리도록 해 만든 화첩인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에는 "국우(國牛)인 흑우가 703마리 관리되고 있다"는 글귀와 함께 사육 전경 등이 담겨 있기도 하다.
제주흑우가 이처럼 예부터 명품대접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맛이 좋기 때문이다.
축산과학원이 2004년 제주흑우고기의 지방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올레인산, 리놀산, 불포화지방산은 일반 한우보다 높고 포화지방산은 낮게 나타났으며, 시식회를 통한 육질 관능평가에서는 향미, 연도, 다즙성 등이 좋다는 반응이 94.5%를 차지했다.
다시말해 육질에 지방성분이 골고루 퍼지는 '마블링' 상태가 뛰어나 고기를 구울 때 지방성분이 배어나오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흑우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산업화시대로 접어들어 육량(肉量) 위주의 축산정책이 펼쳐지면서 1990년 무렵에는 그 수가 수십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
도축산진흥원은 동아대가 1961년에 도내에서 조사한 소사육 실태에서 흑우가 1만1000여마리로 전체 소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점에 비춰 1970-1980년대의 외국산 고깃소와의 교잡이 급격한 도태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식 방법은 = 멸종위기에 놓였던 제주흑우는 1992-1993년에 제주도가 재래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암컷 10마리를,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현 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도 13마리를 각각 확보하면서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도는 이후 제주흑우를 축산법에 따른 보호종축으로 고시해 도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축산진흥원의 자체 연구인력으로 증식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실시된 인공수정 방식은 제주흑우를 고작 250마리로 불리는 데 그쳐 증식 효과가 미진하자 2004년부터 수정란이식기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수정란이식은 암소에 과잉배란을 유도해 체내에서 인공수정한 뒤 7일 후에 자궁에 내려온 5-6개의 수정란을 끄집어 내 대리모인 교잡우에 이를 1개씩 넣어 임신시키는 기술이다.
김영훈 축산진흥원 가축유전자담당은 "수정란이식은 처음에는 송아지 출산성공률이 3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0%까지 높아졌다"며 "1년에 흑우 암컷 1마리에서 12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면서 현재 도내 흑우는 암컷 438마리, 수컷 292마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나 이런 방식도 제주흑우를 2010년 5천마리, 2017년 3만마리 등으로 늘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최근에는 줄기세포연구의 권위자인 제주대 박세필 교수와 손을 잡고 대량증식 기술개발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비와 도비 등 26억7000만원이 투입돼 2013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국책연구사업에는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와 미래생명공학연구소, 충북대 연구진, 도 축산진흥원, 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가 유기적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과제들을 진행한다.
연구 컨소시엄은 체내.외 수정란의 배양조건 확립을 통해 양산된 수정란들을 대량 이식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란 및 생식체포의 성감별, 수정란의 동결, 제주흑우의 특이유전적 표지인자 검증 등의 기술을 폭넓게 개발하게 된다.
푸드투데이 하용준 기자 001@foodtoday.or.kr도는 현재 730마리인 제주흑우를 2017년까지 3만마리로 증식하기로 하고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 등과 함께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한 대량증식기술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흑우의 명품화는 축산농가라면 누구나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시피 저렴한 사료의 안정적인 확보와 왜소한 체격을 키우고 성장기간을 단축시키는 품종개량 등 과제도 적지 않다.
◇왜 흑우를 주목하나 = 제주도는 흑우가 유일하게 도내에서만 사육되고 있는 희소성에다 육질이 뛰어나 담백한 맛을 지니고 있어 일본의 명품 쇠고기인 와규(和牛)처럼 최고급화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기원전부터 제주에서 사육된 것으로 전해지는 제주흑우는 조선시대 세종실록에 "고려시대부터 임금님의 생일과 정월 초하루, 동짓날 등 '삼명일'에 진상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다.
숙종 28년(1702년)에 제주목사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로 부임한 이형상이 섬을 한바퀴 돌며 화공에게 그리도록 해 만든 화첩인 탐라순력도(보물 제652-6호)에는 "국우(國牛)인 흑우가 703마리 관리되고 있다"는 글귀와 함께 사육 전경 등이 담겨 있기도 하다.
제주흑우가 이처럼 예부터 명품대접을 받는 것은 무엇보다 맛이 좋기 때문이다.
축산과학원이 2004년 제주흑우고기의 지방산 성분을 분석한 결과 올레인산, 리놀산, 불포화지방산은 일반 한우보다 높고 포화지방산은 낮게 나타났으며, 시식회를 통한 육질 관능평가에서는 향미, 연도, 다즙성 등이 좋다는 반응이 94.5%를 차지했다.
다시말해 육질에 지방성분이 골고루 퍼지는 '마블링' 상태가 뛰어나 고기를 구울 때 지방성분이 배어나오면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을 느끼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흑우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고 산업화시대로 접어들어 육량(肉量) 위주의 축산정책이 펼쳐지면서 1990년 무렵에는 그 수가 수십마리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줄었다.
도축산진흥원은 동아대가 1961년에 도내에서 조사한 소사육 실태에서 흑우가 1만1000여마리로 전체 소의 20% 정도를 차지했던 점에 비춰 1970-1980년대의 외국산 고깃소와의 교잡이 급격한 도태를 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식 방법은 = 멸종위기에 놓였던 제주흑우는 1992-1993년에 제주도가 재래가축의 유전자원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암컷 10마리를, 농촌진흥청 제주농업시험장(현 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도 13마리를 각각 확보하면서 명맥을 가까스로 유지하게 됐다.
도는 이후 제주흑우를 축산법에 따른 보호종축으로 고시해 도외 반출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축산진흥원의 자체 연구인력으로 증식사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10년 가까이 실시된 인공수정 방식은 제주흑우를 고작 250마리로 불리는 데 그쳐 증식 효과가 미진하자 2004년부터 수정란이식기술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수정란이식은 암소에 과잉배란을 유도해 체내에서 인공수정한 뒤 7일 후에 자궁에 내려온 5-6개의 수정란을 끄집어 내 대리모인 교잡우에 이를 1개씩 넣어 임신시키는 기술이다.
김영훈 축산진흥원 가축유전자담당은 "수정란이식은 처음에는 송아지 출산성공률이 30%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50%까지 높아졌다"며 "1년에 흑우 암컷 1마리에서 12마리의 송아지를 생산하면서 현재 도내 흑우는 암컷 438마리, 수컷 292마리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도는 그러나 이런 방식도 제주흑우를 2010년 5천마리, 2017년 3만마리 등으로 늘리는 데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해 최근에는 줄기세포연구의 권위자인 제주대 박세필 교수와 손을 잡고 대량증식 기술개발에 나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비와 도비 등 26억7000만원이 투입돼 2013년 5월까지 진행되는 이 국책연구사업에는 제주대 줄기세포연구센터와 미래생명공학연구소, 충북대 연구진, 도 축산진흥원, 축산과학원 제주출장소가 유기적협조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과제들을 진행한다.
연구 컨소시엄은 체내.외 수정란의 배양조건 확립을 통해 양산된 수정란들을 대량 이식하는 것을 비롯해 수정란 및 생식체포의 성감별, 수정란의 동결, 제주흑우의 특이유전적 표지인자 검증 등의 기술을 폭넓게 개발하게 된다.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 1 삼양식품, 36년 만에 ‘우지 라면’ 부활…신제품 ‘삼양1963’ 공개
- 2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 취임…“AI·디지털 기반 검역체계 고도화”
- 3 정푸드코리아·화남코퍼레이션, ‘삼포통조림’ GS25 전 매장 입점
- 4 [이슈브리핑]‘시진핑이 반한 맛’ 李대통령 맛있는 외교...황남빵 인기 급증
- 5 지역 농축협 10곳 중 7곳 “농협 홈플러스 인수 찬성”…중앙회는 ‘난색’
- 6 이만희 의원, 식품기업 R&D·장비공유 지원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 7 컴포즈커피, 당근페이 결제 시 ‘최대 1,500원 즉시 할인’
- 8 매드포갈릭, T멤버십 ‘T day’ 진행…최대 50% 할인+에이드 2잔 무료
- 9 농식품부, ‘특성화농업지구’ 신설…농촌특화지구 8개 유형으로 확대
- 10 “이젠 지도 찾아야 먹는다”…대기업까지 뛰어든 붕어빵 전쟁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