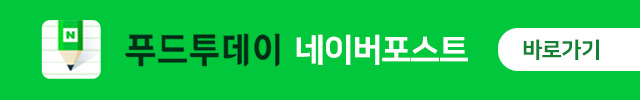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11월 13일)을 앞두고 ‘집중력 향상’, ‘공부템’ 등의 문구를 내세운 식품 광고가 쏟아지면서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한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심리조작형 마케팅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서울대음료’ 등의 표현을 사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두뇌 기능 향상 제품처럼 광고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밥스누는 ‘서울대 초콜릿’, ‘서울대 오메가3’, ‘서울대 약콩두유’ 등 제품을 잇달아 출시하며 서울대 명칭을 전면에 내세운 상업 전략을 펴쳐왔다. 이러한 제품 대부분은 기능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서울대 연구진'이라는 문구를 내세워 일반식품을 마치 기능성 식품처럼 포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서울대는 대한민국의 최고 학문기관이지만 밥스누는 이 권위를 상업적으로 이용해 일반식품을 마치 과학적으로 검증된 기능성 제품처럼 홍보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서울대 명칭을 이용한 오인·혼동 광고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중력·몰입 젤리?”…‘포커스 젤’·‘서울대음료’ 광고 도마 위
문제가 된 제품은 밥스누가 판매하는 ‘포커스 젤(Focus Gel)’과 ‘스마트드링크 퓨어포커스 서울대음료’다. 광고에는 ‘서울대 연구진 공동개발’, ‘아이비리그 협력’, ‘공부 루틴 젤리’, ‘몰입 에너지 4배’ 등의 자극적 문구가 반복되고, 입시 강사 이지영 씨가 직접 출연해 “공부할 때 필요한 젤리”로 홍보했다.
남 의원은 “이 제품은 식약처로부터 어떠한 기능성 인정도 받지 않은 일반식품임에도 ‘집중력’, ‘몰입’ 등의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로 하여금 두뇌 기능 향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퓨어포커스 서울대음료’ 역시 이름에 ‘서울대’를 붙이고 “약국입점 음료”, “의·약대생 공부템”, “ZERO 카페인 집중력 드링크” 등 문구를 내세운다. 광고 이미지에는 교재·노트북·시험 대비 장면이 삽입돼 “의대생이 마시는 공부용 음료”라는 심리적 착시 효과를 유발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두 제품 모두 식약처 기능성 인정을 받지 않은 일반식품이다. 그럼에도 광고는 집중력·몰입 등 ‘두뇌 향상’을 암시해 소비자가 과학적 효능이 입증된 제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팔이에서 의·약대 팔이로”…공공 신뢰의 상업화
남 의원은 “밥스누의 광고는 단순한 과장이 아니라 ‘언어 설계에 의한 신뢰 왜곡’”이라며 “서울대라는 학문 브랜드를 ‘공부 효과가 있는 젤리’, ‘합격템’과 결합시킨 구조는 명백한 심리조작형 마케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행태는 공공 신뢰의 체계적 상업화이자 학문 브랜드의 윤리적 붕괴”라며, ▲수험생·학부모의 심리적 피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신뢰 저해 ▲국가 이미지 훼손 등 다층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제품의 ‘집중력 향상’, ‘두뇌 건강’, ‘수험생 영양제’ 등 표현을 조사해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소비자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광고가 개선되도록 업계에 부당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서울대 명칭은 연구성과를 상징하는 공공자산이지, 상업광고의 브랜드 자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공립대 및 공공기관 산하기업의 명칭 사용 제한과 소비자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단어 자체의 사용만이 아니라, 소비자가 실제 어떤 인상을 받는지를 평가하는 ‘인지 기반 광고 심의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수능 시즌과 같이 특정 타깃층의 심리를 이용하는 광고에 대한 별도 집중심의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2020년 12월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를 시행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제품에는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문구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정제·캡슐형 식품은 기능성 표시가 금지된다.
그러나 시행 5년이 지난 현재 건강기능식품 오인 우려 광고가 전체 부당광고의 94.7%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건수는 5,503건에 달했으며, ‘면역력 강화’, ‘혈행 개선’, ‘집중력 향상’ 등 허위 기능성 문구가 다수였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도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잘못 인식한 소비자가 50% 이상, 기능성 표시식품과 건기식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 응답자는 20.5%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