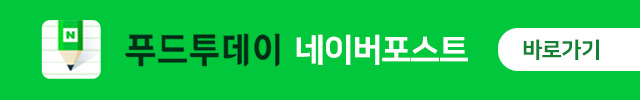[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올해 상반기 K-푸드 수출이 66.7억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지만, 정작 국내 농가는 소득 감소와 수출 소외 속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라면, 소스,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반면, 국내산 농산물 기반의 신선식품 수출은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수출과 농가소득의 괴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에 따르면, 2025년 상반기 라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7억3170만 달러를 기록했다. 중국, 미국, 동남아 시장에서 매운맛 라면이 인기를 끌며 수출을 견인했고, 소스류(18.4%↑), 아이스크림(23.1%↑) 등도 함께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가공식품의 주요 원재료는 밀, 감자, 옥수수, 유지류 등 대부분 수입산으로 채워지고 있다.
실제 업계 관계자는 “라면 한 봉지에 들어가는 밀가루, 팜유, 플레이크 등은 거의 수입산”이라며 “국산 농산물은 일부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가공식품 수출이 늘어도 국내산 농산물의 소비나 농가 소득과는 직결되기 어려운 구조인 셈이다.
반면, 국내 농산물 중심의 신선식품 수출은 2.3% 감소했다. 특히 파프리카는 1년 새 수출액이 25.2백만 달러에서 5.1백만 달러로 급감(-79.8%)했고, 딸기·배·인삼 등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유자(5.5%↑), 닭고기(7.9%↑) 품목만이 소폭 성장했을 뿐이다.
농업계는 “K-푸드 수출 실적과 농가 수익은 별개 문제”라고 지적한다. 농업계 관계자는 “K-푸드가 글로벌 한류 콘텐츠로 주목받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 혜택이 농민에게까지 이어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성은 떨어진다”며 “국산 원재료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 유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현실은 농가경제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농가소득은 5059만원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했으며, 특히 순수 농업소득은 14.1% 줄어든 957만원에 불과했다. 농업총수입은 쌀값과 한우·육계 도매가 하락으로 2.8% 감소했고, 농업경영비는 인건비·전기료 상승 등으로 1.8% 증가해 채산성을 악화시켰다.
농외소득은 2014만원으로 0.7% 늘었지만, 이는 근로·임대수입 증가 영향으로 임업·제조업 등 겸업소득은 오히려 3.1% 줄었다. 실질적인 ‘농업 소득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동물용의약품, 농약, 종자 등 농산업 수출 역시 증가했다고 밝혔지만 이들 역시 기술집약형 품목으로 소농 중심의 현실 농가와는 거리감이 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는 민관이 함께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지만, 그 성과가 국산 농산물 소비 확대나 농가 수익 개선으로 이어졌는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