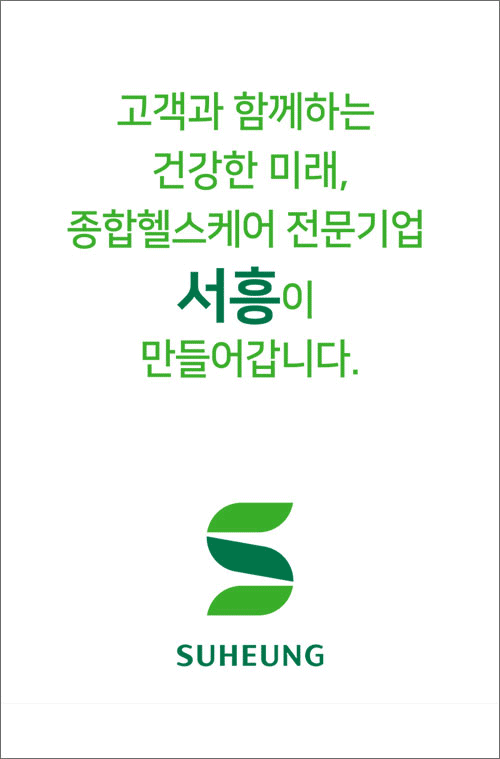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가 국내에서 한 달 넘게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청정 지역이라는 제주에선 또 다른 바이러스 질환인 SFTS(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로 인해 75세 남성이 10일 숨졌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메르스는 병원, SFTS는 야외에서 주로 걸리지만 둘이 닮은 점이 의외로 많다.
특히 증상이 막 나타난 초기에 감기ㆍ독감이나 설사 등 식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 비슷하다.
따라서 열이 나고 설사 등의 증세를 보이면 메르스 관련 병원을 다녀왔는지, 최근에 야외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를 잘 사펴야 한다는 것이다.
상태가 악화되면 SFTS 환자도 메르스 환자처럼 폐렴으로 발전한 뒤 다(多)장기 부전으로 숨질 수 있다.
사람과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도 같다. 방호장비 없이 SFTS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을 만지면 감염될 수 있다.
SFTS의 2차 감염이 환자와 긴밀 접촉한 의사ㆍ간호사 등 의료진이나 가족을 통해 확산된다는 것도 메르스와 비슷한 점이다. 환자의 기관지에 관을 집어넣는 의사,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숨진 환자의 몸을 염하는 사람 등이 SFTS에 감염되기 쉬운 고(高)위험군이란 것도 메르스와 닮았다.
바이러스 감염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 즉 잠복기도 메르스는 2∼14일, SFTS는 6∼14일이다.
증상이 고열기→위험기(폐렴과 다발성 장기부전 등)→회복기 등 3 단계로 진행되는 것도 유사하다.
게다가 메르스(2012년)와 SFTS(2006년)는 첫 환자가 나온지 아직 10년도 안 된 신종 바이러스 질환이다. 또 둘 다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두 질환의 병원체(바이러스)가 모두 자신의 구조를 쉽게 바꾸는 RNA 바이러스여서 이를 정확하게 겨냥해 없애는 특효약을 개발하기 힘들다. SFTS 치료도 메르스 치료처럼 드러난 증상을 줄여주는 대증(對症)요법이 주(主)다. 메르스 환자에게 사용하는 바이러스 치료제인 리바비린(ribavirin)을 SFTS 환자에게도 처방하지만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것까지 두 질병이 닮은 꼴이다.
심지어는 환자의 사이토카인 폭풍(cytokine storm, 면역물질인 사이토카인이 과다하게 생성돼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혈장 교환 치료와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를 시도한다는 것도 같다.
물론 다른 점도 여럿 있다. 메르스 바이러스의 매개 동물이 박쥐와 단봉낙타라면 SFTS는 작은소참진드기가 옮긴다. 바이러스의 종류도 다르다. 메르스는 주로 비말 감염을 통해 전염되는 데 SFTS는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면 걸린다. SFTS를 야생 진드기 병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래서다.
국내에서의 치사율은 SFTS가 오히려 메르스보다 높다. SFTS로 2013년 한 해 동안 36명의 환자가 발생해 17명이 숨졌다. 치사율이 50%에 가깝다. 2014년엔 55명이 감염돼 15명이 생명을 잃었다.